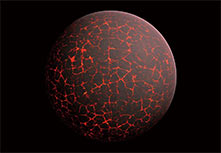Interview : 인터뷰
멸종, 진화의 끝과 시작, 저자 박재용
에디터: 유대란, 사진: 세바스티안 슈티제 © Sebastian Schutyser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징조들을 이미 체감하고 있는 현재, 대멸종이 가까워왔다는 이야기는 마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이 임박하리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대멸종은 진화의 흐름을 바꾸며 지구에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온 생태계의 끝이자 진화의 시작이기도 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멸종 자체보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무지가 아닐까. 『멸종』의 저자 박재용에게 멸종과 진화의 이모저모를 들었다.
전체 생물의 약 95% 이상이 사라지는 대멸종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생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10년 전쯤부터 나오던 이야기예요. 생물이 사라지는 속도를 계산해봤더니 현재 진행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죠. 이렇게 가다간 인간은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생물들은 또 대멸종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인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인류는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 잡고 있는 생물이에요. 우리가 다른 생물들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누구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생태계에서 이런 최상위 포식자 종은 소수만 있어야 하는데 인류는 번식과 적응을 너무 잘하는 거죠. 생태계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분해자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인류는 1차 소비자하고도 싸우고, 2차 소비자하고도 싸우면서 다 물리쳐요. 원래 진화라는 게 같은 층위의 두 종이 싸울 때 적응을 잘하는 종이 살아남고 적응을 잘 못하는 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나머지 파트너를 다 전멸시키는 꼴이죠. 권투로 따지자면 각 체급이 그 안에서 서로 싸워야 하는데 최종 체급이 1차전부터 최종전까지 모든 체급과 싸우는 셈이에요.
항상 과학적 낙관주의자들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칼 세이건이죠. 과학이 진보할 거라는 데는 동의해요. 과학은 발전할 거고 우리는 언젠가 화성에도 진출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이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사회적으로 진보해왔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행복해졌는지 생각해보면, 글쎄요. 인간은 생태계 밖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멸종의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종의 멸종을 막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많은 식물이 멸종한다 해도 인간에게 꼭 필요한 약 300종의 식물은 인간이 키울 수 있어요. 먹을 고기도 키우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풍요로운 지구를 유지하면서 같이 공존하면서 번영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