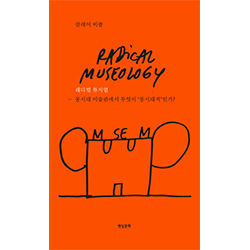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May, 2016
책 편식자를 위한 처방전
Editor. 박소정
불안한 표정이 매력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의외로 순진해서 ‘호구’라 불린다.
고양이를 보면 일단 ‘야옹’ 하고 인사부터 하는 고양이 덕후.
평소 음악이든 영화든 뭐든 틀어놔야 안정이 된다.

『그들은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되었다』 정혜윤 지음, 푸른숲
최근 이사하면서 책장을 장만했다. 기존에 상자나 어디든 빈틈이 보이는 대로 욱여넣었던 책을 모아 책장에 정리해놓았다. 일렬로 꽂힌 책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는 것도 잠시, 누군가에게 일기장을 들킨 듯한 창피함이 엄습했다. 비슷비슷한 제목의 책들, 장르는 한 손에 꼽을 정도였다. 책 편식자라 불려도 마땅했다. 나는 심심한 반성과 함께 오랜만에 큰 서점을 찾아 책 편식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찾았다. 습관처럼 에세이와 인문서 코너로 갈 뻔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영양가가 골고루 들어있는 책을 소개해줄 책을 찾아보았다.
책을 읽을 자유
“인생은 책 한 권 따위에 변하지 않는다.” 저자는 첫 장에서부터 단언한다. ‘과연 책을 얼마나 읽어야 되는 걸까’ 고민하는 나에게 마치 ‘되긴 뭘 돼!’라고 답하는 것 같아 가슴이 뜨끔했다. 책은 ‘로쟈’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서평가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쓴 서평 중 선별하여 147편을 묶고 있다. 그가 읽은 책은 독서 방법, 교양, 고전, 언어, 철학, 미술, 사회, 역사 등 그 범위를 종잡을 수 없다. 그는 『책 읽는 뇌』를 통해 우리가 책에 흥미를 못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전한다. 독서는 선천적 능력이 아닐뿐더러, 전체 인류사에서 보면 극히 최근의 일에 속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벤야민의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인간의 단순한 생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며 우리가 단순한 생명을 넘어서 사고하고 역사를 바꾸어가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책을 읽어가야만 한다고 전한다. 또한 그는 『러시아 미술』을 통해 도스토옙스키를 대표로 러시아 문학의 빛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러시아 미술을 소개한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서 그가 절망 속에서도 끊임없이 희망을 놓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듯이, 러시아 미술 작품에도 험난한 역사 속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분노, 절망, 그런데도 그들이 놓치지 않은 희망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 참고로 책 중간중간에는 ‘로쟈의 리스트’와 ‘로쟈의 페이퍼’를 끼워놓아 인터뷰, 작가를 중심으로 한 작품 소개 등을 실었다. 그중 ‘로쟈의 리스트 10’에서 소개한 『세상을 망친 10권의 책』은 여러모로 유용하다. 저자는 보수적 신학자로 추측되는데 그가 뽑은 리스트를 살펴보면 『군주론』 『인간 불평등의 기원론』 『인류의 유래』 『여성의 신비』와 같은 책들이 올라 있다.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책이 무엇인지 역설적으로 힌트를 건네는 것이다.
그들은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되었다
지금의 나를 만든 책은 무엇일까? 내가 모르던 차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한 인문서, 애매모호한 감정을 정리해준 에세이, 아직도 가슴 속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는 시집까지, 몇 권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도통 이 책들이 나의 사고와 정서에 어떻게 녹아 삶에 깃들어 있는지 설명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저자는 ‘당신을 만든 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11명의 인터뷰를 통해 책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스며들어 영향을 주고 있는지 기록해놓았다. 명쾌한 언변으로 주목받는 평론가 진중권은 어렸을 때부터 『어깨동무』나 『새소년』과 같은 소년 잡지를 많이 읽었는데, 이 책들이 지금 상상력의 원동이 된 것 같다고 전한다. 그는 맥락 속에서 자기만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상상의 도서관 놀이’라 지칭하는데 여기에 독서의 의미를 둔다. 따라서 그는 특정한 책을 추천하기보다 한 권의 책을 탐독하며 다른 책들로 호기심을 계속해 이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임순례 영화감독은 어려운 형편에 중학생이 되어 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책을 접하게 된 순간을 회고했다. 그녀는 “한정된 세상 속에 책을 통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게 좋았다”고 했다. 진한 인간미가 녹아 있는 그녀의 작품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짐작이 간다. 책 속에 실린 11개 인터뷰, 회자된 수많은 책 그리고 그에 가지를 치고 뻗어 나간 이야기 속에서 결국 책이란 한 사람의 이정표와 같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