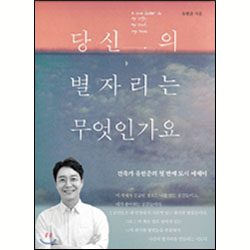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July, 2020
생각하는 별에 산다는 것
Editor.김복희

스타니스와프 렘 지음 김상욱 옮김
오멜라스
가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별이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한다. 연일 더위가 이어지는 나날인데 새벽 무렵 묘하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이마를 식힐 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집에 작은 생명들이 생겨나 아침이면 죽은 채 발견될 때, 이 별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창조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이고 죽이며 긴 시간을 지나올 수 있었나 싶다. 그러니까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생성과 소멸이 너무나도 기이하다. 자연스러워 무섭기조차 하다. 그래서 문득 궁금해진다.
내가 살지 않았던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지 않을 시간에 이 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일어날 것인지 그런 것 말이다. 평균 수명이 백 년도 채 되지 않는 인간으로서는 가늠하기 힘든 긴 시간을 상상해 보게 된다. 만약 이 별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호기심을 가진 일종의 생물이라면 그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상상해 보는 것이다. 측정하기도 어려운 긴 시간 동안 망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수많은 생명체를 살렸다 죽였다 하기 위해 이 지구라는 별은 어떤 의지를 가졌어야 했을까. 의지 따위 없이 어쩌면 순전히 호기심이 많은 까닭으로 지금까지 이런저런 실험을 해 본 게 아닐까 하는, 추론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아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란 결국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어쩌면 인간 중심적인 상상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별, 우리가 지구라고 이름 붙인 이 별은 사실 아무 의식이나 의지도 없고, 악의나 선의도 없이, 마치 중력이 주어졌기에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처럼, 우리가 중력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날 때부터 특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물을 살게 하고 죽게 하고 그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말이다. 만약에 말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별이 의지와 의식을 지닌 존재라고 하면 안 되는 걸까? 이것은 마치 신에 대한 해묵은 추론 방식과도 같다. 나는 이 별이 생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이 별이 생각할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스타니스와프 렘Stanisław Lem의 『솔라리스』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별 ‘솔라리스’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다. 표면상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등장 인간들 켈빈, 스노우, 기바리안, 사토리우스가 있지만, 진정한 주인공은 솔라리스다. 솔라리스는 “지구상의 어떤 유기체보다도 복잡한 구조를 지닌 물질, 그것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도로 진화된 생물임에 틀림없다”는 주장이 가장 신빙성 있게 들리는, 바다를 가진 별이다. 지구 면적 70%를 차지하는 바다의 밑바닥조차도 인간은 가보지 못했는데, 다시 말해 지구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지구인이 과연 솔라리스를 이루는 하나의 생물과 같은 바다를 이해할 수 있을까? 솔라리스의 바다는 ‘수상 산괴tree-mountain’ ‘신장물extensors’‘균상종fungoids’ 등등 새로 지어낸 학술 용어들로 표현되고, ‘생각하는 바다’ 혹은 ‘의식 없는 사고를 보여주는 바다’ 등 인간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미지의 무엇으로 변화무쌍하여 도저히 통계를 낼 수 없는 존재로 표현된다. 기존의, 그러니까 소위 지구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 바다를, 솔라리스를 규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바다는 솔라리스의 기지에 머무는 학자들에게 그들이 의식의 지평에서부터 묻어버린 치명적인 기억을 다시 재구성해 ‘방문자’의 형태로 되돌려준다. 마치 사고실험을 하듯이, 그 기억은 솔라리스를 연구하기 위해 방문한 연구자들이 기억하던 그 인간의 몸, 애인, 아이 등으로 변화해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고통에, 광기에,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 그것이 방문자가 의도한 바가 전혀 아니며, 심지어 솔라리스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결과는 그러했다. “난 인간이 아니고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행복을 원하는 고문 도구라는 개념”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 같다고 켈빈을 방문했던 켈빈의 죽은 아내 레야의 복사물은 말한다.
그리고 죽고 싶어 한다. 나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죽음을 선택한 이가, 어느 날 살아 돌아온다면 어떨까. 내 죄를 묻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곁으로 돌아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행복을 원한다면 어떨까. 그리고는 결국 자신에 대해 알아내게 되고 또다시 내 앞에서 죽고 싶어 한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이를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방문자를 맞이하기 위해, 기꺼이 그 생각하는 별로 가게 될까.
사실 『솔라리스』의 질문은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 환경이든 의식이든, 신이든 그게 무엇이라고 할 수 있든 없든, 알 수 없는 접촉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같다. 그런 별이 있다는 것을 견딜 수 있겠느냐고. 어떤 ‘별’로의 떠남은 진취성이나 낭만성이 아니라, 고통과 광기와 불가해함, 그것에 다름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가겠느냐고 묻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또 나는,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별에 산다는 것, 그러나 그 생각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는 별에 산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고통과 기쁨을 줄 것인가 생각해보고 마는 것이다. 어쩌면 지구에서 내가 느끼는 나날의 고통과 기쁨을 지구의 의지와 지구의 침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솔라리스의 스테이션에서 잠든 학자들의 꿈을 엿보는 솔라리스처럼, 나의 꿈속에 나를 살게 하는 괴로움을 지구가 엿보고 있다면 어떨까. 방문자가 곧 찾아올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