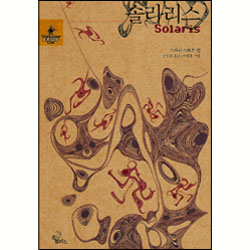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July, 2020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인가요
Editor.김정희

유현준 지음
와이즈베리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와 윗집에서 엄마를 기다린 날들이 많았다. 나는 윗집에서 조용히 동화책 읽기에 심취하곤 했다. 대부분 마음씨 고운 사람의 희생이 이야기의 끝을 빛나게 장식하는 이야기였다. 북두칠성 이야기도 그렇게 기억한다. 가뭄이 심하게 든 해에 착한 소녀가 병든 노모를 위해 국자 가득 물을 구해 집으로 돌아가지만, 지나가는 노파에게 물 한 모금을 나눠준 후 결국 길 위에 쓰러져 죽는 이야기. 지금 찾아보니 기억이 혼합된 것인지 북두칠성 전설 중 착한 소녀의 이야기는 해피 엔딩이다. 소녀의 정성과 결말의 슬픔이 날아가는 듯한 묘한 아쉬움이 들지만, 진정한 마음이 반짝이는 별이 된다는 감성은 아직 내 마음에 살아있다. 어디 마음뿐일까. 마음이 머문 자리가 삶의 별자리를 만든다는 믿음은 내 생각만이 아닌가 보다. 최근에 책 두 권을 연달아 읽었다. 하나는 유현준 교수의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인가요』이고, 다른 하나는 정영민 작가의 『애틋한 사물들』이다. 전자는 공간에 대해서, 후자는 사물에 대해서 자기만의 별자리를 만들어간다.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인가요』에서 작가는 어린 시절 경험과 기억을 떠올려 집 앞 작은 마당에서부터 골목길, 지하철, 건물, 도로나 자연까지 공간에 대한 사유를 열어간다. 책 속의 공간을 따라 생각 여행을 하다 보면, 나의 히스토리가 덩달아 소환된다. 공간에 대한 최초의 기억은 집과 관련돼 있다. 어린 시절, 지금 생각하면 여섯 식구가 모여 살기에는 비좁게 느껴지는 20평 남짓한 집의 거실에는 소파, 책장, 전축과 텔레비전이 있었다. 책장에는 명작 전집이 꽂혀 있었고, 전축 옆에는 LP판이 무수히 있었다. 엄마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책을 읽으셨다. 그때 무심코 봤던 책장과 엄마의 책 읽는 모습이 지금 나의 독서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닐까 생각한다. 내가 소파에서 잠들면 나를 방에 눕히려고 안아 든 아빠의 품이 너무나 포근했던 기억이 난다. 아빠의 사랑에 대한 중요한 기억이다. 그때는 광장이라고 불렀지만, 지금 생각하면 작은 주차장이었던 곳도 의미 있는 공간이다. 또래 친구들과 갖가지 놀이를 벌이는 축제의 장소이기도 했고, ‘병아리-삐약삐약, 참새-짹짹’ 놀이를 하며 어린 동생들을 돌봐주는 장소이기도 했다. 조금 더 커서는 광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골목길 탐험에 인근 동네 놀이터 답사는 말할 것도 없고, 언덕에 올라 친구들과 할미꽃을 찾다가 저녁 어스름에 급히 내려오기도 했다. 성인이 되어서도 유년 시절을 보낸 집과 동네는 종종 꿈에 나왔다. 반복되는 꿈을 통해 비로소 알았다. 그 시절, 그 공간에서의 경험이 내 성장의 근간이 되었음을. 성인이 된 후, 공간에 대한 기억은 주로 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었다. 대학로 빨간 대문의 카페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여의나루역의 한강 고수부지에 묻어둔 슬픔이 있고, 아직도 쳐다보면 마음이 아린 서장대가 있다. 그리고 20대를 관통한 지하철 4호선이 있다. 유현준 교수는 이 책에서 묻는다. “여러분의 지하철은 몇 호선인가?” 이는 곧 다음과 같은 물음이기도 하다. “당신의 히스토리가 되는 공간은 어디인가?” 누구나 책을 읽으며 자신의 발자취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희미한 별자리가 된다. 책은 가볍게 읽히지만, 떠오르고 얽히는 생각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 나의 발자취로 나의 별자리 이야기를 만드는 일, 멋지지 않은가. 앞서 소개한 책이 공간의 발자취라면 정영민 작가의 『애틋한 사물들』은 사물에 얽힌 사유의 발자취이다. 그 사유들이 얼마나 개인의 삶을 애틋하게 담고 있는지, 책을 손에서 놓기가 힘들었다. 다 읽고 책을 덮은 후에는 가슴에 폭 안고 싶을 정도였다. 그리고 토닥이고 싶었다.‘당신도, 나도 많이 애썼습니다. 애써 들여다보고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삼았으니 기특합니다’ 하고. 작가는 “사물을 다루는 법을 익히면서 조금씩 더 단단하고 섬세해졌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물을 다루는 법을 익혀가면서 성장해 왔다. 작가는 뇌병변 장애인으로, 사물을 대하는 그의 시각은 남달랐다. 작가는 ‘단추’를 끼우며 의지를 익혔다. 단추를 끼우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하여 몰입했던 순간은 기적과도 같았다. 작가는 기적의 진짜 세계를 엿보는 경험이 축적되어 일상을 더욱더 능숙하게 마주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기적의 찰나, 내가 만들어낸 진짜 세계. 여러 번 집중하고, 성공을 이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빛나는 사유이다. 그런가하면 작가는 ‘식판’을 통해 역경을 경험하기도 한다. 남들이 ‘오늘은 어떤 반찬이 나올까’를 궁금해하는 동안에 그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식판을 들고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했다. 그에게 식판은 역경의 상징이자 타인의 도움을 얻어 여러 사람에게 끼치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매체이기도 하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 그 상황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도 삶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은 아프지만 필요하다. 넘어져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는 힘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생기기도 하니까. ‘안경’에 대한 통찰에서는 내심 찔렸다. 나는 고도근시로 안경을 끼고 렌즈를 끼며 불편을 감수하며 살고 있지만, 한 번도 그것이 장애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작가는 말한다. 시력 저하도 장애라고. 하지만 다수가 겪는 것이기에 장애로 인식되지 않는 다고. 다수의 통념이 소수의 상황을 특수한 장애로 만드는 폭력에서 우리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
앨리스가 문 속의 문을 열어가며 이상한 세계로 들어가듯이, 작가는 일상의 사물들을 익히며 세계의 문을 하나하나 열어간다. 문을 여는 열쇠는 ‘반복의 일상을 견디는 힘’이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 그것을 견뎌내는 힘이 개인이 가진 삶의 깊이가 된다. 작가는 말한다. “내공은 반복을 통해 쌓이고, 내공이 쌓이면 그 사이로 기적이 뛰어들 틈도 생긴다”고. 하지만 매번 어김없이 똑같은 삶이 어디 있으랴. 이를 간과하지 않고 작가는 다시
말한다. “우리는 삶을 통해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삶이 빚어내는 차이에 의해 성숙한다.” 같은 듯 매번 달라지는 일상 속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될까. 매 순간의 선택, 삶을 해석하고 이끌어가는 통찰은 독특한 아우라를 빚어내며 삶의 리듬을 만든다. 그 빛나는 아우라는 내가 밟아온 공간, 나를 거쳐 간 사물을 뛰어넘으며 형성된다.
두 권을 책을 읽고 생각해본다.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자리의 빛을 어떻게 연결하여 나의 별자리를 만들까. 그 별자리에서 빛나는 나의 아우라는 어떤 형태의 어떤 광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