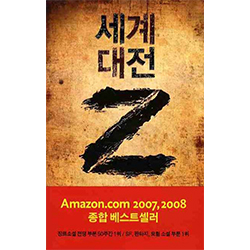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July, 2017
검색하고 가르치고 즐기고
Editor. 박중현
어머니께서 팔다리 저림 증상을 앓고 계시는데 뚜렷한 차도가 없어 고민입니다.
관련한 고급 정보나 추천 병원이 있으시다면
부디 에디토리얼에 적힌 제 메일로 조언 주시길 부탁드리옵니다.

어니스트 시턴 지음
푸른숲주니어
어릴 적 <명견 실버>라는 만화를 재미나게 본 기억이 있다. ‘실버’ 라는 개가 주인공으로, 아버지의 원수이자 지역의 폭군인 ‘붉은 투구(붉은곰)’에 맞서 싸우는 것이 주된 이야기다. 그 과정에서 하나둘 다른 개들과 우정을 쌓으며 무리를 형성하고, 인간과도 종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며 성장해 나간다. 실버와 동료 개들은 하나하나 개성 넘치는 인격체로 묘사되었으며 긴 모험 속에서의 우정과 사랑, 정의 등을 그려내 흥미롭기 그지없었다. 실버가 성장해 아버지 ‘리키’로부터 배운 필살기 ‘절천랑 발도아(입을 중심으로 몸을 고속으로 회전하며 날아가 강력한 원심력과 이빨로 상대의 근육과 뼈를 순식간에 절단하는 기술)’로 붉은 투구를 제압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사실 워낙 오래전 작품이라(일본에서 ‘은아 흐르는 별’이란 이름으로 1986년에 제작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명견 실버’로 전해진 것) 오늘날까지 가슴 절절히 간직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호 잡지를 준비하다 도서관에서 발견한 책을 통해 헤묵은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라, 그 파편을 건져 올려본 것이다. 그 책이 바로 『어니스트 시턴의 아름답고 슬픈 야생동물 이야기』이다. 사실 도서관에 간 것도 ‘동물이야기’를 보려고 온 것은 아니었다. 야생동물의 생태 정보나 현재 처해 있는 그들의 위기, 그 원인과 예상되는 결과 등의 ‘정보’를 찾으러 온 것이었다. 말하자면 자료를 찾을 생각이었지 그들의 삶과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 생각은 아예 머리속에 없었음을 고백해야겠다.
“나는 자연사에서 동물들을 너무 평이하게 그려 내는 바람에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든다.
열 쪽가량의 간단한 설명과 단순한 그림 몇 장으로 인간의 관습이나 풍습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까?”
무언가에 홀리듯 『어니스트 시턴의 아름답고 슬픈 야생동물 이야기』를 집어 들고, 잠시 묘한 감정들이 내 안을 뒤죽박죽 다녀갔다. 처음에는 ‘엥? 이런 게 다 있어?’였다가 ‘뭐야, 무슨 동물 얘기를 사람처럼 해놨네(웃음)’였다가 ‘아니지, 사실 이게 이들의 삶을 더욱 진실하게 표현한 거 아닌가?’ 정도로 바뀌곤, 문득 ‘맞아, 옛날에 나도 무슨 개 나오는 만화(이때는 아직 명견 실버인지 떠올리지도 못함)를 사람 얘기보다 흥미진진하게 봤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글로 옮겨본 당시의 내적 정황이다.
물론 (슬프게도)어른의 관점에서 다시 떠올린 <명견 실버>이야기는 웃음이 터져 나올 정도로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다. 절천랑 발도아라니, 어릴 땐 뜻이나 알고 이런 걸 소리쳐가며 따라 했던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사—우정과 사랑, 정의 등—는 분명 인간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모르고 알려 하지 않을 뿐 지금 이 순간에도 야생동물들을 비롯해 우리 곁에서 함께 살고 있는 동물들 역시 그들만의 이야기를 살고 있을 테다. 우리 사회는 대부분 ‘똥오줌 훈련시키는 법’ ‘덜 짖게 하는 법’ 등의 훈육만을 잠언처럼 새기고, 각종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SNS 등지의 귀여운 동물들(만)을 구경하며 힐링 받고, 처음 만난 동물이라도 귀엽다며 서슴없이 대하거나 동물원에 가서 새우깡이나 던지는 게 익숙하도록 되어 있지만 말이다. 인간의 삶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하지만 그들의 삶과 이야기를 조금 더 풍부하고 적극적으로 들어보려 하는 일은 분명 현대 인간의 삶이 잃어버린 안타까운 풍경과 정서가 아닐까 싶다.
“야생 동물은 늙거나 병이 들어서 자연적으로 죽는 일은 거의 없다. 그들의 최후는 언제나 비극적이다.”
『어니스트 시턴의 아름답고 슬픈 야생동물 이야기』에는 우리가 잊고 지낸 바로 그런 ‘동물이야기’가 담겨 있다. 읽어본 바로는 사실 그렇게까지 슬프진 않다. ‘휴, 인간이 또 얼마나 잔혹했을까’ 하는 예상도 그렇게까지 들어맞진 않는다. 굳이 인간이 아니더라도 야생동물들은 언제나 자연이라는 죽음과 맞닿아 있다. 동물과 싸워온 (과거의) 인간들도 처절하지 않았던 게 아니다. 이 책을 쓴 저자 역시 실은 늑대를 비롯한 수많은 야생동물 사냥 경험이 있고, 사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쓸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더이상 대립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삶을 잊는 것은 노예를 부리는 몰지각한 귀족과 다름없으며, 민생을 살피지 않는 파렴치한 위정자의 몰상식에 가깝다. 물론 이 표현에 깃든 상하관계 역시 경계해야 한다. 언제까지고 인간이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다고 취해 있는다면, 우리를 품고 있던 자연의 얼굴이 언제고 죽음으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