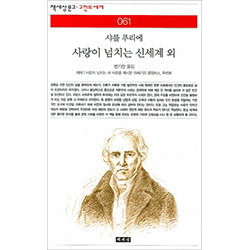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June, 2019
n의 언어
Editor. 박중현
사적으로 고른 책에서 하나의 키워드로 불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당분간 한국문학을 더듬습니다.

유계영 지음
문학동네
41호 「사적이고 불친절한 책 선택」에서 시는 이기적인 언어라고 말한 적 있다. 오직 자신(시인)을 위해 부화한다고도 했다. 시는 남 얘기를 하거나 눈에 들어오는 풍경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지 얘기이거나, 애초부터 지 얘기이다. 시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는 ‘퓨어’한 자기 얘기는 물론이고 남 얘기를 한들 결국 그 남에 대한 내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게 시이고, 풍경 얘기를 한들 결국 그 풍경이 나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말하는 게 시다. 남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시 같은 건 없다. 그런 게 시인 세상이라면 시가 시가 아니거나 세상이 세상이 아니다.
시의 창작을 두고 ‘부화’라고 표현한 것은 기성에 없던 언어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같은 시는 없다. 모든 시는 유일한 언어다. ‘언어’란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 쓰는 수단을 가리킨다.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고 태어나야 한다면, 그건 기존에 수단이 없거나 기존 수단이 나타내거나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의 ‘부화’는 아브락사스Abraxas로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 알을 깨는 경험과 닮았다. 그렇게 또 하나의 세계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는 이기적인 언어다. 다시 말해 순 제멋대로라는 소리다.
기분은 어제를 좋아하니까 헛짖는 것이다/ 냉장고에 붙여둔 포스트잇이 내일을 향해 킁킁거릴 때/ 너는 도대체가 관심이 없겠지만/ 국 데워먹어라 사랑한다 이 문을 열면 네가 좋아하는 신선한 바다
—‘개와 나의 위생적인 동거’ 일부
그런데 시의 매력은 그 제멋대로에 있다. 세상은 너무 정돈돼 있다. 정확히 말해 정돈되어 있을 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했다. 설명할 수 있고 규격화할 수 있어야 한다. 보기 좋아야 한다. 우리의 일상은 그것에 맞게 조여 있고, ‘나사’가 헐거워질 때마다 다시 빡빡 조이거나 조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지만 매 순간 마주하는 삶은 그렇지 않다. 일일이 설명 가능할 만큼 논리적이지도 않고 매번 해명되지도 않는다. 모두 정의롭지도 않고 모두 비열하지도 않다. 삶은 다양하나 모든 삶은 유일하다. 세상에는 존재하는 삶의 수만큼 n개의 세상이 존재한다. 고작 44개밖에 안 되는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가며 일일이 소통하기는 쉽지 않다. 시는 그때 필요한 ‘n’의 언어다.
울지 말고 잘 들어/ 내가 말했기 때문에 울기 시작한 것이라면// 극적으로 병들고 싶었지만 절반쯤은 건강하고 싶어서/ 절뚝이게 된 사연이라면
—‘우리는 친구’ 일부
이상한 일이다/ 죽은 이에게 산 자의 취향대로 고른 티셔츠와/ 스웨터와 점퍼와 코트를 입혀두는 것은/ 이 많은 빨랫감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저승이 이승보다 춥다는 오류는
—‘왼손잡이의 노래’ 일부
이는 기성 세계의 위계를 전복하거나 경계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시의 태생이 지닌 불가항성을 뒤집어 보면, 드러나는것은 기존 언어가 지닌 오류나 모순 혹은 비호환성이다. 또한 마블 유니버스 정도로는 명함도 못 내미는 ‘다중 세계’가 이미 일상 아래 개인의 수많은 삶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주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시를 좋아하는 일은 정서의 교집합을 그리는 일이다. 그러니 시가 안 읽히거나 ‘해석’ 안 된다고 조금도 상심할 것 없다. 남 얘기란 게 원래 처음엔 잘 안 들어온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꾸 끌린다고? 축하할 만한 순간이다. 모르긴 몰라도 뭔가 파장과 정서가 맞는 거다. 삶에 ‘언어’가 하나 늘었다고 봐도 좋다(‘외계어’라 해도 좋다). 그런데 왜 좋은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정확히 정상이다. 아무리 잘 팔리는 시집이라도 인터넷 서점 리뷰란에 게시물이 가뭄에 콩 나듯 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