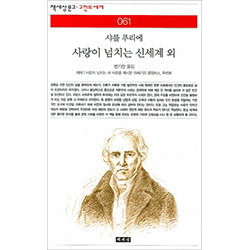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June, 2019
이해를 묻다
Editor. 김선주
읽고 싶은 책은 날로 늘어가는데 읽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느린 독자.
작은 책방에서 발견한 보물 같은 책들을 수집 중.

원도 지음
이후진프레스
“이 책 안 읽은 사람 없게 해주세요!”
한 독립서점에서 책을 소개하는 글에 덧붙인 애절한 외침이었다. 이곳뿐만이 아니었다. 여러 독립서점과 독자들로부터 ‘인생책’이라느니, 올해의 가장 인상적인 책이라느니 마치 대단한 문학상을 받은 대작에 붙을 법한 찬사들이 120페이지 남짓한 작은 독립출판물에 쏟아졌다. 출간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수차례 품절과 재입고를 거치며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는 책, 바로 『경찰관속으로』다. 평소에도 독립출판물 소식을 염탐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한 달 만에 입소문이 제대로 나버린 핫한 책을 이제야 소개하게 된 데는 몇 가지 변명 같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선 처음에 제목만 보고 직업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책 중 하나일 뿐이라고 오해했다. (책을 다 읽고 난 지금은 그것이 분명한 오해였음을, 그리고 그러한 오해를 한 나 자신이 부끄러울 따름임을 고백한다.) 또 다른 이유는 이미 수많은 사람이 나서서 홍보하고 있는데 굳이 나까지 보태기보다는 다른 좋은 책을 발견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이 또한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이 책은 더 많이 읽혀도 모자라다.) 결과적으로 나는 결국 이 책을 만났고, 이 알 수 없는 씁쓸하고 짠맛을 무엇으로든 배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에 풀어보려 한다.
언니에게 건네는 인사로 시작하는 이 책은 실제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작가가 일하는 동안 보고 느낀 것을 편지 형식으로 쓴 것으로, 그저 누군가에게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야기를 ‘언니’라는 이름에 기대어 이야기한다. 산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을 눈 앞에서 목격한 사람의 생생한 감정은 부치지 못한 편지에 실려 독자에게 전해진다. 데이트 폭력과 자해, 끔찍한 사고와 자살, 웃지 못할 별의별 해프닝까지 뉴스에서 보던 일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심정은 참담함을 넘어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기까지 하다. ‘건실하고 건강한 사람만이 목숨이 아니고 생명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선 살 가치가 있는 삶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자신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슬퍼한다. 정의감으로 시작했지만 경찰관도 결국 하나의 직장인에 불과할 뿐이고, 같은 시민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일들을 마주하면서 작가는 묻는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이기적은 것은 아닌지 걱정하면서.
언니, 나는 정말 묻고 싶어. 이 상황에서 누가 짐승이고 누가 인간이야? 누가 인간이길 포기한 거지?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이 꾹꾹 눌러 담은 절절한 고백은 단순히 직업적 고충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아프고 먹먹하다. 타인의 이야기뿐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던 자신의 친오빠도 편지 속에 등장시켜 고백은 더욱 솔직하게 와닿는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무지하다. 더구나 완벽히 타인일 때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작가는 이해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반면 너무 이해돼서 아프고 미안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나와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묻는다. 인간으로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냐고, 나를 이해할 수 있냐고 말이다. 그리고 개개인의 문제처럼 보이는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은 결국 작가의 시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귀결된다. 당장 범인을 제압하는 것보다 총알 값이 더 귀해서 테이저건을 쏘지 못하게 하는, 위험한 사람이 쉽게 풀려나도 그로부터 24시간 보호할 수 없는, 피해자는 고통 속에 사는데 가해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과연 나쁜 것은 사람일까, 사람을 둘러싼 것들일까 많은 생각이 든다.
『경찰관속으로』는 ‘경찰관 속으로’라는 의미와 ‘경찰, 관속으로’ 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작가는 순직한 주변의 경찰들을 보며 자신과 동료들의 길 끝에도 죽음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매일 삶과 죽음의 현장을 뛰어다닌다. 한 국회의원의 ‘미친개’ 발언이나 시민들의 ‘견(犬)찰관’이라는 비아냥에도 그저 경찰관으로서의 일을 할 뿐이다. 힘있고 나쁜 경찰 말고 작은 파출소에서 사람들 사는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진짜 경찰로서.
이 편지가 끝나면 잠시 나를 위해, 그리고 어딘가에서 지금을 이겨내고 있을 경찰관을 위해 기도해줘. 나도 언니를 위해 기도할게. 더는 아플 일이 없을 거라는 불가능한 말보다는, 아파도 적당히 아프길,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아프기를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