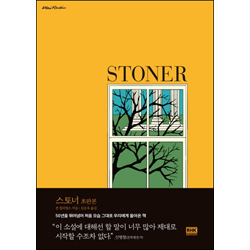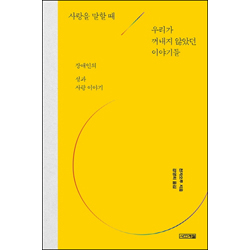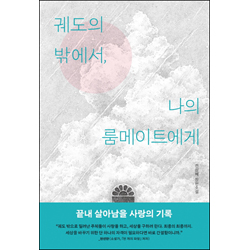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November, 2021
깊숙이 가라앉기 때문에
글.김정희
꿈꾸는 독서가. 책을 통해 세계를 엿보는 사람. 쌓여가는 책을 모아 북 카페를 여는 내일을 상상한다.

박연준, 장석주 지음
난다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출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박연준, 장석주 시인이 쓴 『우리는 서로 조심하라고 말하며 걸었다』는 그들의 한달 호주살이 이야기를 담은, 김민정 시인이 결혼 선물로 마련해준 책이다. 출간으로 결혼식을 대신했다고 하니, 이 책은 그들의 결혼식이자 신혼여행과도 같다. 결혼식이 누군가의 기억이나 몇 장의 사진으로 남지 않고 책으로 엮여 가늠할 수 없는 시간 내내 계속 전해질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백년해로를 능가하는 낭만이 아닐까. 다시 말해 너무나 작가다운 낭만, ‘책 결혼식’ 되시겠다. 거기다 한 달 동안 그들이 본 호주의 풍경과 일상을 각자가 언어로 엮어낸 것이니, 교환 일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상자에 고이 잠들어 있는 연애 교환일기를 나는 차마 깨우지 못하지만,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에 대한 부러움과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을 떠올리는 설렘으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시인 박연준이 담은 일상은 햇빛 아래 반짝이는 잔잔한 물결 같았다. 과연 그 세밀한 결까지 모두 비춰 보이는 듯했는데, 남편과의 일상에 대해 얘기하는 구절에서는 유독 애정이 반짝거렸다. 남편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촉촉했다. 작은 다툼에 속이 상해 취한 상태로 ‘스스로 와인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부분은 꽤 사랑스럽기도 했다. 진탕 마신 와인을다 게워내고 그 자체로 와인이 된 자신의 모습과, 그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를 토하며 쓰러진 줄 알고 기겁했을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며 피식 웃는 그녀의 모습에서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누군가로 인해 속이 상해 어쩔 줄 몰라 하고, 누군가를 걱정해서 허둥대는 모습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에, 함께 웃음을 머금기도 했다.
박연준의 남편인 장석주 시인의 글은 그녀와는 사뭇 다르다. 박연준 시인의 에세이는 부드럽고 유려한 표현들이 섬세한 생각들과 잘 어우러져 있었지만, 장석주 시인의 글은 도돌이표 달린 문장처럼 느껴졌다. 마치 학창 시절에 배운 청춘예찬이나 신록예찬을 방불케 했으니, 그의 글에 감히 이름을 붙이자면 ‘걷기예찬’이 마땅하겠다. 아내와 함께 하는 일상보다 그 자신의 내면과 철학, 관찰자로서 바라본 호주에 대한 사색이 가득한 글이었다. ‘책 결혼식’의 신랑 측 에세이가 나는 퍽 서운했다. 신부에게 조금 더 집중해주면 좋으련만. 그녀가 와인이 된 날, 그의 놀란 마음은 그녀가(혹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단 몇 줄에 걸쳐 서술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기적인 것도 같다.
다시 읽은 책의 서문에서, 나는 두 사람의 사랑이 지닌 깊이를 재발견했다. 박연준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 감정을 아는 것, 사랑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나는 순해졌습니다. 지독함이 스스로 옷을 벗을 때까지, 사랑했거든요.” 서로 같은 마음일것이라는 환상에 가까운 기대가 자꾸만 부딪히며 깨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아집을 바라보게 된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능한 일이다. 아집의 옷을 벗는 것은 자신을 깎아내는 힘이 필요한 일이고, 이 역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결혼 12년 차, 남편을 만난 지는 15년도 넘은 나에게 사랑은 그리워하기에도, 동경하기에도 이미 너무 멀리 있는 무엇이었다. 하지만 나의 사랑도 결코 지금이 종착지가 아님을, 사랑은 그리 쉽게 생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 속 깊은 믿음을 박연준의 말에 기대어 지켜낼 수 있었다. 어쩌면 사랑은 그 가치가 지닌 무게만큼 심연 깊숙이 가라앉는 것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