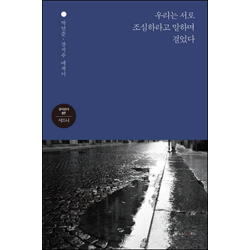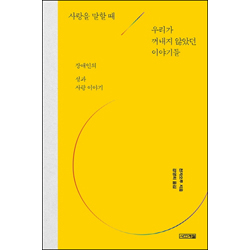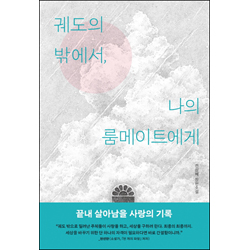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November, 2021
한 시절의 너에게
글.김민섭
작가, 북크루 대표. 책을 쓰고, 만들고, 사람을 연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존 윌리엄스 지음
김승욱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소설 『스토너』를 두고 “이 소설에 대해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나는 제대로 시작할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나 또한 이 문장에 깊이 동의한다. 하고픈 말은 많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니 할 수 있는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어떻게 골라내야 할지 시작부터 막히고 말았다.
주인공 윌리엄 스토너의 인생은 기구해 보인다. 그는 처음 만난 여자에게 반해 문득 결혼하고(정말이지 문득이라 표현할만하다), 박사과정 수료 후 정교수가 되지 못한 채 시간강사로 계속 일하다가,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급격한 파국에 이른다. 나는 이 책을 올해 여름에 읽었다. 누군가가 주인공을 보며 나를 떠올렸다고 한 덕분이다. 아마 ‘시간강사’라는 주인공의 직업이 나와 같았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된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해본 이야기에 쉽게 이입하기 마련이다. 나는 곧바로 스토너가 되어 책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고, 다 읽을 때까지 몇 번이나 깊은 한숨과 눈물을 보였는지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물론 내가 한숨과 눈물이 다소 넘치는 성격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겠지만.
이 책은 모두에게 찾아올 한 시절의 사랑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에 대해 말한다. ‘문득’ 결혼한 스토너와 아내는 대화의 주제도, 아이를 키우는 방법도,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도, 모든 것이 달랐다. 두 사람은 완벽하게 다른 곳을 바라보며 걸었고, 그렇게 서로 멀어졌다. 결혼을 하며 아주 잠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기는 했으나, 이내 서로를 지나쳐 각자의 방향으로 계속 걸어갔을 뿐이다. 그래서 스토너는 자신이 사랑하게 될 한 시절의 사람 캐서린을 발견하자 그에게 깊이 빠져든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 시작은 ‘언어’에서부터였다. 스토너는 캐서린의 논문을 읽으며 “그래 그렇겠지”라든가 “세상에”라며 혼잣말을 한다. 단어의 선택, 문장의 배열 같은 요소들이 세미나에서 본 그의 태도와 겹치면서, 캐서린이 너무도 사랑스러워진 것이다.
캐서린과 스토너가 함께한 시간은, 내가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담아 둔 다음의 문장을 인용해야만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사랑이란 무언가 되어가는 행위, 순간순간 하루하루 의지와 지성과 마음으로 창조되고 수정되는 상태”이다. 사랑에 대한 이토록 명확한 정의를 본 일이 없다. 결이 맞는 두 사람의 만남은 그 자체로 무언가 되어가는 행위이고, 또한 서로의 지성과 마음이 새롭게 만들어지며 서로를 바꾸어 나가는 일이다. 이전의 스토너는 늘상 자기 방에 틀어박혀 외롭게 일했었지만, 캐서린과 함께하면서부터는 달라졌다. 그는 거의 팽개치다시피 했던 공부를 캐서린의 방에서 다시 시작한다. 캐서린은 그 옆에서 자신의 논문이 될 책을 계속 써 나간다. 한 시절의 인연이란 이런 것이다. 서로가 무언가가 되어가는,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스스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만들어 가는 사이.
우리에게는 자신의 한 시절을 함께할 소중한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눈이 있다. 때로는 언어가 힌트가 된다. 연약한 시절을 거치며 어떻게든 자신의 언어를 지켜내고 단련해가는 사람들은 서로의 언어를 금세 알아본다. 살아가는 동안 언어와 세계가 닮은 상대를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그러한 인연은 더욱 값지고 그리운 것이 된다. 어디선가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흐르는 그 세월에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라는 나미의 노래 ‘슬픈인연’의 가사가 들려오는 듯하다. 한 시절을 함께했던 두 사람에게 이후 찾아온 거대한 슬픔과 파국에 주목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들이 한 시절의 사랑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부러워해도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