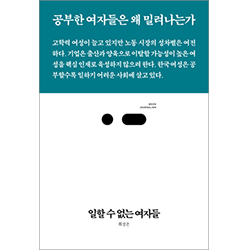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April, 2019
평론의 일
Editor. 박중현
사적으로 고른 책에서 하나의 키워드로 불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당분간 한국문학을 더듬습니다.

신형철 지음
한겨레출판
아름답게 쓰려 하지 말고 정확하게 써라. 아름답게 쓰려는 욕망은 중언부언을 낳는다. 중언부언의 진실은 하나다. 자신이 쓰고자 하는 것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느낌의 공동체』 중 「그러고는 덧붙인다, 카버를 읽어라」
좋은 평론을 만났을 때의 경험은 ‘아~ 그렇구나’가 아니다. 시원함이다. 그렇지, 이런 거지. 맞아. 내가 느낀 게 이런 거였어(이야, 참 말 잘하네). 그렇다면 이는 글쓴이가 읽는 이보다 뛰어나서일까? 똑똑해서일까? 투표소에서 출구 조사하듯 양측을 비교해 면밀히 분석해본다면 대체로 그렇다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으나, 이는 엄밀히 상관관계에 놓여있다고 보기 힘들다. 뭐랄까, 독서를 많이 한 이가 그렇지 않은 이보다 서사의 흐름이나 논리 구조를 좇을 때 매끄러움을 느끼는 것처럼, 평론가에게는 대상(작품)이 독자와 사회에 갖는 의미를 정확한 언어로 내어놓을 수 있는 회로가 닦여 있을 뿐이다. 좋은 평론가란, 요컨대 단련된 이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평론은 아무도 재미없는 소설만큼 공허하다. 혼자만 알든, 작가랑 둘만 알든, ‘팬’이 끄덕여주든, 사실 그 전부가 연기거나 그러려니 하는 허상이든, 자위일 뿐이다. 사랑은 정확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굳이 거창한 의미를 발굴하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사실 알아도 이미 별 효용 없는 지점까지 가버린 것을 애써 부여잡고 내세우며 우쭐하거나 작가의 미소를 얻는 일이 아니다. 주례사처럼 만인에게 공평한 덕담도 아니다. 기계적으로 책 뒤에 그럴싸한 ‘공략집’ 혹은 ‘해석’처럼 붙여넣어 권위를 부여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어렵거나 안 읽히는 건 너희의 무지야’라는 식으로 항변하는 일도 아니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일은 더더구나 아니다. 문학의 ‘일’ 만큼 평론의 ‘일’ 역시 명료해야 한다. 무언가를 해석해내기 위한 것이라면, 애초에 작품 단계에서 틀렸다.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았어야 하므로. 그 해석이 어렵다면, 더더욱 틀렸다. 무엇을 위한 해석이냐는 물음에 답하지 못하므로.
영화평론은 영화가 될 수 없고 음악평론은 음악이 될 수 없지만 문학평론은 문학이 될 수 있다. ‘뭔가’에 들러붙어서 바로 그 ‘뭔가’가 되는 유일한 글쓰기다. —『느낌의 공동체』 중 「문학이 된 평론을 읽는다」
평론집 역시 팔려야 한다. 팔 수 없는 이유도 사지 못할 이유도 없다. ‘작품에 대한 해석’을 누가 보겠냐는 말은 스스로 평론의 가치와 미래를 꺾어버린 관념이다. 잘 모르겠는 영화 해석을 위해 들여다보는 ※결말 완전 분석※ 같은 블로그나 리뷰 글과 다름없다는 인식이다. 하나의 작품에 굳이 하나의 평론만 요구할 명분도 없다. ‘하나의 최우수’가 존재할 수 있을까? (뻑 하면 ‘독자의 몫’ 운운할 거면 애초에 읽기 드럽게 힘든 하나의 비평의 존재의의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럼 우리의 감상은 유엔 안보리 평화 결의처럼 만장일치 통일되는가? 같은 이야기라도 누구의 언어로 출력되느냐에 따라 시원하고 짜릿한 쾌감을 받거나 반대로 감흥 1도 없는 경험은 정녕 아무도 안 해본 걸까.
비평가는 시집과 소설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문학적인 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질문으로 전환해내는 사람이다.—『몰락의 에티카』 중 프롤로그 ‘21세기 문학 사용법’
잘 쓴 평론은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평론이다. 문학이 개인(대중)의 의식과 정서, 사회 속 자기 인식(실존) 형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문학평론 역시 마찬가지다. 오랜 세월과 과정을 거쳐, 아직도 지나오는 중이지만, 오늘날 평론이 보다 또렷한 언어로 분명한 문제 의식을 개념화하는 현상은 반갑다. 이는 문학의 변화를 담지하는 것이기도 하고 근원에는 사회가 투영돼 있기 때문이다. ‘발견’해내는 일은 비단 눈 밝은 평론가의 시력(視力)에 의존할 일만은 아니다. ‘언어’는 대상을 지칭할 필요에서 생기며 새로운 언어는 새로운 대상에서밖에 부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외도를 하다 자살한 여자’라고 요약할 어떤 이의 진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톨스토이는 2000쪽이 넘는 소설을 썼다. 그것이 『안나 카레니나』다. 이런 작업을 ‘문학적 판단’이라 명명하면서 나는 이런 문장을 썼다. “어떤 조건하에서 80명이 오른을 선택할 때, 문학은 왼을 선택한 20명의 내면으로 들어가려 할 것이다. 그 20명에게서 어떤 경향성을 찾아내려고? 아니다. 20명이 모두 제각각의 이유로 왼을 선택했음을 20개의 이야기로 보여주기 위해서다.—『정확한 사랑의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