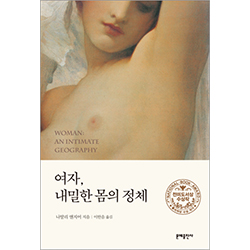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September, 2016
누구의 무엇도 아닌
Editor. 박소정
불안한 표정이 매력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고양이를 보면 일단 ‘야옹’ 하고 인사부터 하는 고양이 덕후.
눈보다 귀가 발달한 편이라 소음을 피하기 위해 항상 BGM을 틀어놓는다.

나무의철학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도 없을 것이다. 한 발 떨어져 보면 매일 아침 일어나 같은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다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보통 끔찍함을 느낄 여유도 없이 하루를 보낸다. 일상을 제외하고 반복을 거듭하는 일 중 최고 난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개인적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힘들 게 오르고 또 그 길을 다시 내려와야 하는 반복의 연속인 ‘등산’이 아닐까 싶다. 대학 졸업을 얼마 앞두고 느닷없이 가장 가파르고 힘든 코스로 한라산을 올랐다. 일종의 셀프 극기 훈련 같은 것이었는데 큰 기대와 달리, 그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은 없었다. 며칠간 쓰디쓴 근육통을 겪으며 스스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좀 더 실감할 수는 있었다. 그때를 계기로 두 번 다시 등산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던 것 같다. 체력적인 한계가 가장 크게 와 닿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돌이켜보니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길을 걷는 동안 끊이지 않았던 나와의 독대, 그 속의 낯섦과 불편한 감정이었다.
영화 같은 실화를 담아낸 『와일드』의 저자 셰릴 스트레이드 또한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PCT에 발걸음을 내디딘 그 순간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길만큼 긴 시간 동안 자신에게 말을 건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왜 계속 걸어야 하는가’ ‘엄마는 왜 갑자기 내 곁을 떠난 걸까’,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뿌리 깊은 고민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른다. 누구라도 좋으니 어떤 말이라도 해주었으면 좋으련만, 땅과 바람과 나무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길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할 뿐이다.
“인생이란 얼마나 예측 불허의 것인가. 그러니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본문 중
26살에 세상의 전부와도 같았던 엄마를 갑자기 떠나 보내게 된 셰릴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견디기 위해 자신을 망가뜨리기 시작한다. 알코올과 낯선 남자들과 충동적인 관계에 집착하고 급기야 헤로인까지 손을 댄 그녀는 중독의 세계로 빠져든다.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고 감싸주던 남편은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녀를 무작정 끌고 나온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려 애를 쓰지만, 다시 정상에 오르기는 쉽지 않다. 끝내 모두 부질없다는 생각이 든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이혼을 택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점으로 PCT를 선택한다. 그녀가 이혼하며 새로운 성으로 고른 스트레이드Strayed는 ‘자기 갈 길에서 벗어나 버린, 길을 잃어 방황함’을 뜻하는 단어로 그녀가 처한 힘든 상황과 앞으로 펼쳐질 날들을 잘 보여준다.
그녀가 걷기로 한 PCT는 멕시코 국경에서부터 캐나다 국경에 이르는 4,285km 달하는 엄청난 거리로, 길 위에서 폭염과 폭설, 들판과 사막, 방울뱀과 곰, 퓨마 등을 마주하는 험난한 코스다. 그녀는 몇 번의 굳은 결심과 몇 주간에 걸친 단단한 준비 끝에 겨우 길 위에 오른다. 자신의 몸집에 두 배 정도 되는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다. 여정 초반에 그녀는 습관처럼 멈춰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본다. 그리고 다시 길을 걸으며 속으로 발걸음에 맞춰 숫자를 세기도, 추억이 담긴 노래를 불러도 보며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잊어보려 노력한다. 발톱이 반 이상 빠지고 육체적 고통이 더해질수록 그녀는 오히려 감정적인 상처에서 벗어나 그 누구의 무엇도 아닌 온전한 자신을 찾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 자신의 힘을 믿게 된 그녀는 좀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야생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며 점점 여정을 즐긴다.
PCT의 여왕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까지 얻은 그녀가 종착지인 신의 다리에 무사히 도착한 여정들을 살펴보면 셀 수 없는 발걸음이 결국 자아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PCT와 같은 거대한 도전은 아니었지만, 지난날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내가 느낀 나와의 독대가 자유롭기보다 힘들었던 것은 아마 스스로 마주하는 과정이 생소하고 낯설었기 때문일 것이다. 평소 스스로 자유롭고 독립된 주체라고 생각해왔지만, 어디까지나 내가 속한 울타리 안에서나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직면하는 순간 강인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이것을 애써 피하고 싶은 생각이 교차했던 것이다. 하기 싫지만 그래도 살아내기 위해 결국에는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힘들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엄마의 품에 있던 아기가 첫걸음마를 떼며 더욱 넓은 세상을 보며 커가듯,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의 두 발로 세상에 우뚝 서는 것이 예전의 자신보다 성장할 수 있는 첫 단계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