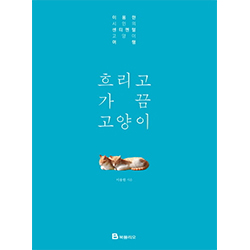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October, 2016
후천적 정신 과잉 활동가
Editor. 김지영
할 수 있는 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다. 그럴 때면 아침에 일어나
멀뚱멀뚱 눈만 뜬 채 천장을 바라보다 밥 먹을 때만 이불 밖으로 나와 밥을 먹고 또 이불 속으로.
딱 겨울잠 자는 개구리. 침대에 너부러져 자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부키
얼마 전 짝사랑하는 사람의 친구들을 만나는 술자리가 있었다. 3시간 정도 흐르고 기억이 없다. 소위 말하는 ‘필름’이 끊겼다. ‘어울리기 위해 술을 조절하지 않았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종로의 ‘불금’이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필름이 끊’길 만한 상황이었다. 사람이 많아 벅적벅적한 공간에서는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산만하다는 걸, 내 몸 하나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남들 기분 맞춰준다고 주는 술 다 받아 마셨으니 그럴 수밖에.
중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둔팅이’나 ‘몽글이’로 불리며 ‘천사표’라는 별명을 명찰처럼 달고 다녔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소설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불량감자’ ‘중2병’으로 불렸다. 평상시 사물을 보는 시선부터 빛, 바람, 냄새 등 감각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 누군가 나를 건드리는 게 싫었다. 그렇게 1년 동안 감각훈련을 하고 나서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오감이 예민해졌고 감성적인 사람으로 변했다. 아마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걸 싫어하는 것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감각이 반응할 만한 모든 부분(사람의 생김새나 행동, 말투, 음성의 높낮이 등)에 온 신경이 쏠려 머리에 과부하가 일어난 게.
정신 과잉 활동가가 어때서?
대학에 들어가 친해진 학과 선배에게서 크리스텔 프티콜랭의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를 선물받았다. 이 책을 읽은 다음부터 나는 나 자신을 ‘후천적 정신 과잉 활동가’라고 표현했다.
1권에서 저자는 유난히 발달한 감각체계 때문에 고충이 많은 사람, 즉 나처럼 쉴 새 없이 온갖 정보를 잡아내는 기민한 오감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버거운 사람들을 응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실 그들은 천재에 가깝다. 감각이 예민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같은 일을 맡겨도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월등히 높다. 예민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감각이 좋고 꼼꼼하며 상대가 원하는 바를 잘 잡아낸다. 이 점은 일에서만이 아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생각이 많아 더 큰 피로를 느끼고 지쳐버린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행운(감각적임)을 다듬는 방법이다. 1권을 읽고, 나 자신을 ‘후천척 정신 과잉 활동가’라고 부르며 다독였다. 확실히 마음의 짐을 덜어낸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실전 대입이 잘 안 되어 더욱 고민거리가 쌓였다.
‘정신 과잉 활동가’로 변하면서 주변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라진 것은 나 때문이고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내게 있다고 생각했다. 그 탓에 두꺼운 가면을 쓰고 남들을 대했다. 그래서 ‘가식덩어리’라거나 ‘위선적’이라는 말도 자주 들었다. 남을 이용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를 바랐지만, 그들은 콧방귀만 꼈다. 나는 점점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2권 생존편은 정신적 과잉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보다는 주로 실전(직장, 연애, 인간관계)을 대하는 자세와 자신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를 돌파해 나갈 방법을 설명한다.
직장에서 이들은 자존감이 낮아 애초에 목표를 낮게 잡는다.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상사나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우는 동료들을 매일 보면서 망연자실하기도 한다. 아니면 능력이 있어도 눈치가 없어 사내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인간관계에 흐름을 탈 수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는 기분을 느끼기 쉽다. 정신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불안해한다. 자기 딴에는 노력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노력의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
이 두 권의 책을 동시에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1권이 생각이 많아 고민인 사람들에게 신경학적 이유를 설명하고 ‘예민한 게 이상한 건 아니다’라며 설득하는 어조라면, 2권은 이미 생각이 많은, 활발한 정신활동가들에게 방법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두 권의 책을 관통하는 저자의 주장은 자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영재성이 보이거나 풍부한 지적 잠재력이 나타나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과한 시달렸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비친다.
자신의 자아를 찾아내 유지하고 보듬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잘 다듬은 자아를 일으켜 세우면 예민한 감각으로 다른 이들보다 일상에서 행복을 찾기 쉽다. 예를 들면 도시에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잔다는 것이나 비 온 뒤 젖은 풀냄새를 맡으며 거리를 거니는 것을 삶의 낙이나 쾌감으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