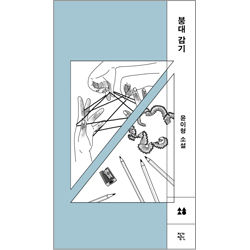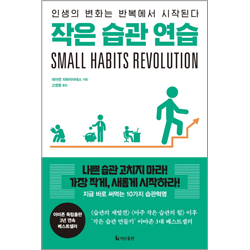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March, 2020
코미디의 힘
Editor. 김유영
페이지를 넘길 때 온몸이 따뜻해지는 책을 좋아합니다. 누구를 만나긴 귀찮은데 위로가 필요한 날 읽기 좋은 책을 소개할게요.

줄리아 스튜어트 지음
현대문학
힘들고 지친 날이면 다들 스트레스를 푸는 해소법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고민을 떨쳐낸다든가 술을 들이켜며 우울감의 끝을 달린다든가. 나에게 최고로 먹히는 비법은 바로 맥주 한 캔을 따고 시트콤을 보거나 코미디 책을 읽는 거다. 결점투성이인 주인공들의 모습에 웃음을 토해내고 나면 그날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잦아든다. 시트콤 속 인물들은 종종 기상천외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이유로 극심한 갈등을 빚곤 한다. 하지만 그들의 치명적인 단점에 눈살을 찌푸리기보다 그들이 벌이는 우스꽝스러운 소동에 웃음이 나온다. 그렇게 한바탕 웃고 나면 지난날 ‘이불킥’하던 내 흑역사까지 별일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페리고르의 중매쟁이』는 웬만한 TV 시트콤 못지않게 웃기고 익살스러운 코미디다. 책은 33명밖에 살지 않는 프랑스 남서부 시골 마을 ‘아무르 수르 벨르’에서 벌어지는 온갖 소동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그린다. 아무르 수르 벨르에 사는 주민들은 평범해 보이면서도 제각기 개성이 뚜렷하다. 작가는 캐릭터의 외양이나 습관, 독특한 버릇이나 과거사 등을 소개하는 데 페이지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각 인물이 마치 내 옆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처럼 친근하게 느껴진다. 코딱지만 한 마을인 아무르 수르 벨르는 33명의 개성 넘치는 주민들 덕에 매일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어떤 날엔 두 노부인이 자기 요리가 더 맛있다며 시장에서 토마토를 던지며 싸우고, 어느날엔 모든 주민이 가발을 쓰고 돌아다니며 인구조사를 나온 공무원을 속이려고 소동을 벌인다. 어딘가 하나같이 모나고, 치사하고 엉뚱한 주민들의 행동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사랑스럽다.
코미디의 정점을 찍는 인물은 다름 아니라 책의 주인공이자 아무르 수르 벨르의 유일한 이발사인 기욤 라두세트다. 20년 넘게 떳떳한 이발사로 일해온 기욤은 어느 날 큰 슬픔에 빠진다. 아무르 수르 벨르에 사는 주민들이 나이를 먹고 중년이 되자 대부분 대머리가 된 것이다. 더 이상머리를 깎을 사람이 없으니 기욤은 사십 대를 넘겨서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했고, 그런 그가 선택한 직업은 바로 중매쟁이다. 여기서 이제 진짜 코미디가 시작된다. 아무르 수르 벨르에 사는 대부분은 이미 결혼을 했거나, 독신이더라도 작은 마을에서 함께 몇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서로 알 만큼 다 아는 사이다. 더군다나 기욤은 26년전 첫사랑에게 부치지 못한 고백 편지를 아직까 어느 순간부터 아날로그, 레트로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눈에 띄게 늘더니 이를 다루는 책도 점점 많아졌다. 특히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문구 열풍이다. 기록하는 도구로서 문구의 매력을 고백하는 책, 문구의 과학이나 역사를 소개하는 책, 문구 여행기까지. 필기를 할 일이 줄어드는 시대에 문구의 약진이라니 의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당연한 존재였던 문구가 이제는 굳이 찾아 소비해야 하는 특별한 취향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듯하다. 실은 이런 흐름을 타고 관련 책들을 찾아보며 남몰래 문구 사랑을 키워오던 참이었는데, 크기도 제각각인 각양각색 독립출판물의 군집 속에서 하얀 표지에 달랑 제목과 이름만 적힌 이 단순한 책이 유독 눈에 띈 것도 그런 관심 덕분이었으리라. 심지어 모나미 볼펜 모양으로 디자인한 책등과 옛날 타자기 느낌이 물씬 나는 독립 활자 디자이너의 본문 서체까지, 이 정도 감각의 책이라면 그 내용이 뭐든 간에 일단 호기심을 달래고 볼 일이다.
기욤의 인생은 희극과 비극이 뒤엉켜 독자를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잡아 둔다. 손님들이 대머리가 돼서 강제 퇴직을 당하질 않나, 26년 만에 만난 첫사랑에게 중매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질 않나… 말 그대로 ‘웃픈’ 일이 연거푸 일어나니 그의 애처로운 비극이 이젠 귀엽게 느껴진다. 남의 사랑 이뤄주려고 낑낑대고, 자기 사랑에 쩔쩔매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의 모습이 어째 그리 우습게만 느껴지진 않는다. 실수투성이고 모자란 인물을 익살스럽게 그리는 코미디는 어딘가 기괴망측하고 우스꽝스러운 우리인생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페리고르의 중매쟁이』는 완벽하지 못해서 더 인간적이고 사랑스러운 33명의 주민을 모아 놓은 떠들썩한 시트콤 그 자체다. 주민들끼리 치고 박는 모습을 웃으며 보고 있자니 그날 하루 동안 내게 일어났던 불쾌하고 거북한 일이 한 점처럼 작게 느껴진다. 코미디는 각 인물의 단점이나 실수를 우스꽝스럽게 그리면서도 그들을 비웃거나 단죄하지 않는다. 오히려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 단점을 감싸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코미디를 보다 보면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우스운 단점이나 버릇까지 웃으며 받아들일 용기가 생긴다. 내 안에 있던 슬프고 비극적인 에너지를 웃음으로 뱉게 하는 것이야말로 코미디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자책과 우울함으로 하루를 끝내고 싶지 않은 날에는 『페리고르의 중매쟁이』를 다시 꺼내 깔깔 한바탕 웃어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