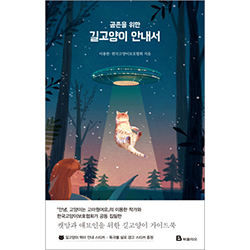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March, 2018
차이
Editor. 박중현
『바깥은 여름』에 대한 불친절하고 사적인 한 마디.
“까닭 모를 눈물 혹은 설렘.”

문학동네
다소 고루한 시각인지도 모르겠으나, ‘작가’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곤 한다. 왜일까. 이는 작가의 생산물인 문학이 예술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재미는 기본!) 문학의 예술성이라는 건 뭘까. 단어에서 풍기는 느낌은 거창하지만 실은 명료하다.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이해의 간극을 좁히는 일이다. 다시 말해 문학이 활자를 벗어나 독자 현실의 삶을 움켜쥐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까지 없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 속을 깊숙이 채울 때이다. ‘이해’의 대상은 대체로 타인이며, 간혹 진정한 자신을 가리키기도 한다.
“안에선 하얀 눈이 흩날리는데, 구 바깥은 온통 여름일 누군가의 시차를 상상했다.”
김애란은 자신의 단편소설집 『바깥은 여름』 이름의 배경에 대해 위와 같이 말한 바 있다. 보통 수록 작품 중 하나를 표제작으로 골라 제목으로 하는 것이 관행이었기에 밝힌 공공연한 뒷이야기. 동시에 문학의 본질을 서정적인 관점에서 잘 꿰뚫고 있는 한 마디. 그런데 왜 ‘상상’했다고 표현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문학의 고질적이면서 본질적인 딜레마를 엿볼 수 있다.
우리는 정말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나?
어쩌면 ‘삶’의 딜레마일지도 모를 이 물음은 비단 김애란뿐 아니라 많은 작가를 여전히 회의케 한다. 그렇다면 가능성을 알 수 없는 일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글쎄, 행위 자체에 담긴 의미가 더 크거나 혹은 전부라고 해도 좋을 일도 있지 않을까. 지치지 않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끈질김, 잊어선 안 될 (것만 같은) 소중한 것을 필사적으로 더듬는 일, 그 ‘온도’를 잃지 않는 일, 그 과정을 잊지 않는 일. 이러한 일의 가치가 당장 눈으로 드러나는 결과나 결말보다 소중할 때가 있다고 믿어볼 뿐이다. 책은 읽는 행위가 중요하고 결말은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는 클리셰적 멘트에 대한 개인적 근거이기도 하고.
이십대 때 섬세함은 까다로움으로, 정의감은 울분으로, 우수는 의기소침함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염려했는데, 주제넘은 생각이었다. 변한 건 내 쪽이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그간 조각처럼 툭툭 꺼냈던 얘기기도 한데, 작가란 사람들이 평소 잘 포착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삶의 이치 등을 역시나 흔히 떠올릴 수 없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존재가 아닐까 싶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따라붙어야 한다. 그럼에도 깊고 너른 공감을 이끌어낼 것. 이러한 작품(구체적 순간으로는 문장)을 목도했을 때 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1.시간이 멈춘 듯 몸과 머리 일시 정지.
2.조용히, 눈동자가 반 배 정도 커진다. 미간에 힘이 들어가고 책과 눈 사이 거리가 5cm가량 가까워진다.
3.속으로(가끔 입 밖으로 새어 나오지만) 짧은 감탄사를 내뱉는다. 비속어나 욕의 형태를 띨 때도 있다.
고백하자면 『바깥은 여름』은 김애란 작가 책이라는 점이 선택에 90% 이상을 차지한 책이다. 그리고 위의 반응은 그녀의 작품과 동행하노라면 꽤 익숙히 경험하게 되는 감각이다. 눈치챈 분도 있겠지만, 실은 지금까지 서술의 화살표는 김애란 작가와 『바깥은 여름』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니 되돌아가 본 도서를 떠올리며 받아들여도 좋다. 사적으로 덧붙이자면 기존의 ‘쉽고 세련되면서도 미친 공감을 자랑하는’ 작가의 표현력은 여전하며, 플롯의 구성과 전달력, 그리고 그녀식으로 소화해 낸 개인의 감정과 시대적 실존 양태 역시 반 세대 정도 성숙해진 인상이다. 어쩐지 그간 내게 ‘김애란’은 여러모로 ‘서른’의 이미지로 자리 잡혀 있었는데, 그녀는 이미 더 많은 얼굴과 틈을 조용히 바라봐온 듯하다.
나는 외국소설보다 한국소설에 좀 더 깊은 애정을 느끼는 편이다. 씀, 읽음, 생각함, 이야기함 모두 더 가까운 우리에서 태어나 함께 자란 고민과 마음, 행동과 경험이기 때문이다. 잊고 있던 우리의 안을 두드려 보는 건 어떨까. 어쩌면 무언가 고개를 돌려올지도 모른다.
나는 자주 눈을 감았고 가끔 그 증발이 아까워 환하게 웃었다. 낙하산 줄을 잡아당기듯 입꼬리를 올렸다. —「풍경의 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