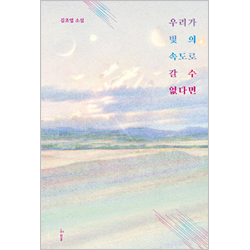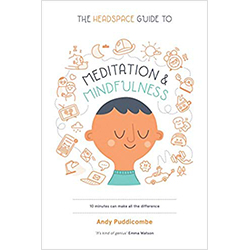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July, 2019
주 52시간은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Editor. 이희조
지식과 지혜가 함께 자라길 바라는 잡식 독자입니다.
세상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나의 여유를 지키고자 악착같이 노력합니다.

이한솔 지음
필로소픽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보도됐을 때, 여느 때와 달리 이색적인 검색어 하나가 큰 화제를 모았다. 바로 ‘표준 근로시간 준수’, 스태프들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 영화를 촬영했다는 사실이었다. 배우, 감독 누구도 이것이 이렇게 큰 주목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테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가 노동 조건에 민감한 사회가 됐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물론 영화 스태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게 이렇게 큰 화젯거리가 된다니 씁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았을 테다.
문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예술과 노동 중 어느 쪽에 있는지 고민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예술가는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성취를 얻기 때문에, 예술가의 창작 활동은 일반적인 노동과 다르게 인식된다. 그래서 창의적인 일을 하니 조금 덜 버는 것 정도는 자연스럽게 용인된다는 인식이 일하는 주체와 고용자, 소비자 모두에게 존재한다.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가 ‘창의적’이고 어디서부터가 ‘창의적이지 않은’ 일일까? 창작 활동을 하는 즐거움과 성취는 다른 일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일까?또한 영화, 드라마처럼 엄청난 규모의 인력과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작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온종일 기다란 마이크를 들고 현장음을 따는 녹음 기사의 역할은 어디까지가 예술일까? 스케줄 관리부터 스태프 식사 주문까지 온갖 잡무를 맡는 조연출은 또 어떨까? 앞으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더욱더 대신하게 된다면, 그때는 예술가가 진정한 노동자로 인정받게 될까? 이처럼, 예술과 노동을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어렵다는 이유로, ‘이 바닥이 원래 이렇다’는 이유로, ‘일단 방송은 내보내야지’라는 이유로, ‘어차피 너 말고도 할 사람 많다’는 이유로, 영화나 드라마 현장은 이제껏 방치되어왔다. 많은 배우가 시상식에서 스태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지만, 그들의 노동 조건 개선은 매번 쪽대본처럼 밀리고 또 밀려왔다.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 시청자들을 웃고 울리며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드라마 만드는 사람들의 노동 환경은 그들이 만드는 드라마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 —이한빛 PD 유서 중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조연출이었던 이한빛 PD는 2016년 10월 드라마 종방연을 마친 이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막내 PD라는 이름으로 도맡아 했던 일은 온갖 잡무와 부당 해고된 비정규직 스태프들에게 주어진 계약금을 도로 뺏어오는 것이었다. 또한 24시간 러닝타임에 새벽 2~3시에 들어와 겨우 한두 시간 자고 나가는 생활을 55일간 반복했다. 휴일은 겨우 이틀이었다.
『가장 보통의 드라마』는 이한빛 PD의 동생이 형의 죽음을 겪은 후 드라마 현장 스태프들의 제보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그들의 삶과 애환을 조명한 책이다. 유가족은 이한빛 PD의 뜻을 이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하여, 미디어 신문고, 현장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며 방송 제작 환경 개선에 힘쓰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드라마 현장에서 ‘한빛센터’의 이름은 이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한빛에 제보하지 그래?’라는 악의적인 농담이 오고 갈 정도이다. <기생충>을 비롯해 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제작 환경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는 분명 한빛센터의 기여도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은 드라마 산업을 다루고 있지만,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월급제, 일급제, 외주제작 등 수많은 고용 형태가 등장한다. 단순히 갑과 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도 가감 없이 등장한다. 근로자를 생각해 만든 선의의 구호들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가 수많은 고용 형태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듯, 이제는 우리들이 직접 최선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그러니 회사원이든, 문화 산업 종사자든,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든, 주 52시간제 근무를 원하든, 주 100시간을 일해도 많이 버는 게 좋은 사람이든, 누구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