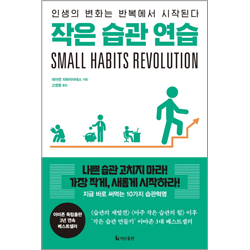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March, 2020
작가정신
Editor. 박중현
한국소설을 좋아합니다. 씀, 읽음, 생각함, 이야기함 모두 곁에서 태어나 함께 자란 고민과 마음,
행동과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느린’매체를 구독하는 느낌이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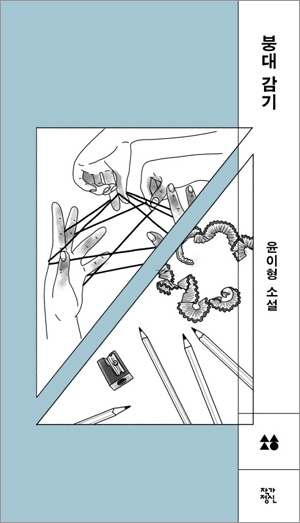
윤이형 지음
작가정신
누군가 “요즘 가장 성장하는 한국 작가를 꼽는다면 누구라고 생각해?”라고 물어온다면 답은 “윤이형”이었다. 사실 ‘성장’이라는 것은 오묘한 표현이다. 신체적 성장을 제외하면 결국 성장이란 어떤 주관적 기준에 따라 내리는 연역적 판단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주관적으로 내린 ‘성장’이라는 평가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나 실은 반대인 경우도 있다. 게다가 꼭 어떤 시점에서 완료되리라 확신할 수도 없고, ‘성장’이라는 말에 씐 긍정적인 이미지와 달리 실상 성장 주체는 그 과정에서 고통은 절대로 수반하는 반면 쾌락은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주 고독하고 가끔 위안을 얻는 것. 마냥 낭만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성장의 서사와 메커니즘은 실은 매우 담백하고 무미건조할 때가 많다.
이렇듯 성장이 오묘한 표현임에도 “윤이형”으로 단언한 것은 그 궤적이 너무도 선명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비행기가 날아가며 하늘에 남기는 비행운 수준이 아니라, 마치 쟁기로 땅을 갈아엎어 나가듯 노동과 고민, 나아감이 뚜렷하다. 기준 삼은 것은 그의 작품 속 여성주의 서사의 과녁과 궤적이다. 내가 윤이형 작가를 눈여겨본 것은 “신전들이 무너지고 우상들이 깨져 실려 나간 빈자리에 가치관의 재건작업이 시작되었다”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는 2016년 이후부터다. 이른바 페미니즘에 대한 각성이었다. 하지만 ‘각성’ 역시 성장만큼이나 마냥 멋있는 경험이 아니다. 앞으로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런 건’ 안 하는 게 경험 단위로는 행복할지 모른다. 더구나 개인이자 작가로서 인생 중반에 “가치관의 재건작업”을 하며 감내했을 균열과 마찰, 고통은 감히 상상도 못 하겠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을 모두 담아냈기에 그의 작품은 성장의 빛을 발한다. 더구나 이채를 띤다. (미안하지만 독자로서는 이런 거 너무 소중하다.) 그간 윤이형이 보여준 여성주의 서사는 달랐다. 마냥 문제 장면만을 기록하는 르포이지도 않았고 이를 위한 미러링이지만도 않았다. 물론 충실히 ‘현장’을 포착하지만, 실제로 그에게 포착되는 문제 역시 ‘현장’만이지 않다. 무엇이 정상이고 누가 주체인가, 무엇이 왜 지워지는가, 왜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가능한가, 같은 여성임에도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 사실임에도 우리는 왜 여전히 그 ‘민낯’에 충격과 황망함을 느끼는가. 도돌이표처럼 다시 돌아가 욕만 하며 무너진 신전을 비워둘 셈이 아니라면, 아프게 고민하더라도 애써 나아가야 한다. 자신과 모두를 위해서.
그간 내가 읽은 윤이형의 성장 궤적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다가, 무언가를 하니까 또다시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는건 연대가 아니야. 그건 그냥 미움이야. 가진 것이 다르고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계속 밀어내고 비난하기만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이어질 수 있어? 그리고, 사람은 신이 아니야. 누구도 일주일에 7일, 24시간 내내 타인의 고통만 생각할 수 없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니? 너도 그럴 수 없는 걸 왜 남한테 요구해?
그리고 현재로서 단독 저자로는 마지막 책일 확률이 높은 장편소설 『붕대 감기』에 와 비로소 어떤 티핑포인트가 읽힌다. 해결의 실마리랄지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점 같은 게 보인다. 『붕대 감기』는 10명 정도 화자의 목소리를 읽을 수 있는 옴니버스 형태 소설이다. 또한 드물게도 이들의 목소리와 삶이 서로 영향을 맺고 있고, 실제로 교차하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여성이다. 해미, 은정, 지현, 진경, 세연, 윤슬, 경혜, 형은, 명옥, 효령, 세이. 나이, 직업, 재산, 학력, 가정환경 등 각기 처한 입장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여성이 맞닥뜨리는 거의 모든 유형의 ‘고통’을 읽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지만, 이들간의 우정을 그리고 연대로 나아간다는 점이 더 반갑다. 왜 반목했고 같은 문제에 대한 태도가 달랐는지, 무엇이 오해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투쟁이 아닌 화해로 나아가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연대의 모양새를 띤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여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짜나가야 할 ‘태피스트리tapestry’의 형태와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