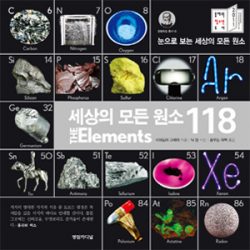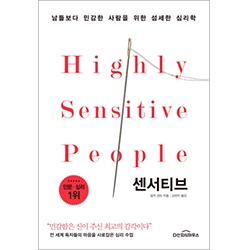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April, 2017
예술가가 사랑한 술
Editor. 김지영
그 정도를 막론하면 일주일 중 나흘은 술과 함께한다.
술이란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행복해진다.
가끔 내 주업이 에디터인지 프로알코올러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시그마북스
나는 맥주를 참 좋아한다. 꼭 노동 이후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에 몰두했다가 긴장이 풀렸을 때 마시는 맥주는 이루 표현하기 힘든 시원함을 안겨준다. 갓 따른 생맥주를 마시면 목구멍에 밀어닥치는 엄청난 알싸함이 쾌락으로 바뀌면서, 왠지 모르게 “나는 이걸 한 번에 다 마실 수 있어”란 용기가 생긴다. 현재 맥주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알코올음료의 대표 주자다. 물론 좀더 대중적인 손길을 타면서 맥주가 대량 소비 상품으로 전락해 명성이 실추된 감도 있지만, 최근 소규모 수제 양조의 혁명이 일어날 만큼 애주가들에게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맥주는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술을 접해본 것은 아니라서 다양한 술 예찬을 펼치긴 힘들다. 아마 술에 관해 ‘지론’이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술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술자리를 좋아합니다” 정도로 얼버무리며 대답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수줍은(?)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귀동냥했던 책이 『생각하는 술꾼』이다. 이 책은 주류 전문가인 벤 맥팔랜드와 톰 샌드햄이 30여 년간 학구적인 자세로 음주에 임해오면서 경험하고 조사해온 결실이다. 맥주와 사이다, 와인, 럼주, 테킬라 등 다양한 종류의 술을 카테고리별로 나눠 그 기원이나 생성 과정, 대표 주당의 에피소드 등을 정리해 한 권에 담았다.
이 중 가장 눈길이 가는 건 예술가들의 술 사랑이다. 빈센트 반 고흐를 논할 때 압생트를 빠트리면 아쉽다. ‘초록요정’이라고도 불리는 압생트는 당시 고흐가 파리의 카페에서 카미유 피사로, 클로드 모네, 오귀스트 르누아르 같은 화가들과 만날 때면 테이블에 으레 놓여 있었다고 한다. 압생트는 고흐의 사후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흐의 무덤 옆에는 관상용 나무가 한 그루 심겨 있는데, 이 나무에는 압생트의 환각 효과를 내는 성분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인 튜존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럼주의 영웅이라고도 불렸다. 1932년 육아에 지쳐 도망치듯 친구와 함께 쿠바로 휴가를 떠났던 헤밍웨이는 쿠바의 플로리디타 바에 앉아 럼주를 마셨다. 그러다 쿠바가 좋아서 눌러앉기로 결심하고 20년을 더 머물렀다. 쿠바에 있는 동안 그는 노상 플로리디타 바에서 럼주를 마시고, 밤이고 낮이고 맨발로 럼주에 취해 뻗어있었다. 그는 쿠바에 있는 동안 『노인과 바다』를 써 1954년 퓰리처상을 받는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했다.
“예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종류든 미적 활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리학적인 전제 조건 하나가 꼭 필요하다. 바로 취하는 것이다.”
실제로 헤밍웨이나 빈센트 반 고흐 말고도 플라톤이나 호메로스, 심지어 시트콤 <치어스>의 놈 피터슨도 술을 사랑했다. 어쩌면 니체의 말처럼 술은 우리의 잠재의식을 더욱 분발시켜 용기, 자신감, 창의성을 북돋워 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근심이 줄고(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거나, 술자리를 좀 더 솔직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도 하니까. 하지만 언제나 옳던 술도 자제력을 잃는 순간 세상 그 어떤 사이코패스보다 무섭게 돌변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핀을 갓 뽑은 수류탄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