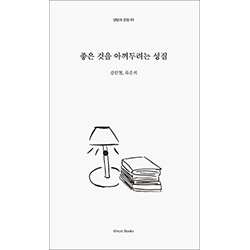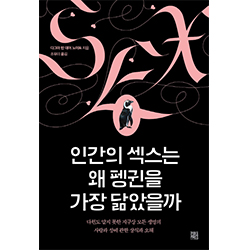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June, 2017
알맹이를 찾아서
Editor. 박소정
잔병치레가 잦아 각종 건강 정보를 두루 섭렵 중.
집사가 될 날을 고대하며 동네 길고양이들과 교감 4년 차.
삶의 균형을 위해 생각은 적게, 몸은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음산책
옷에 대한 관심은 무서울 게 없다는 중학교 시절 최대치를 찍은 것 같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사준 옷만 입고 다니던 내가 직접 옷을 사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매일 교복만 입는 게 억울해서였을까 교복을 수시로 줄이고 풀며 유행에 동참했고, 소풍이라도 가는 날이면 어떤 옷을 입을지 며칠 전부터 심사숙고하곤 했다. 대학생이 되며 옷에 대한 고민은 그때보다는 적어졌지만 자잘하게 다른 종류로 늘어나 질량보존의 법칙을 이어갔다. 매일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과 학교 행사라도 있는 날이면 도대체 어떤 옷을 입어야 무난할까 고민하기 일쑤였다. 시간이 흐르며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가고 타인의 시선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 옷에 대한 걱정은 자연스레 잦아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날도 옷은 의식주의 일부로 삶에서 무시할 수 없는 큰 고민거리다. 특히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에게 ‘점심에 뭘 먹지’와 더불어 ‘오늘은 뭘 입지’는 여전히 커다란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가끔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 출근 전 이 옷 저 옷 입어보다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곤 부리나케 회사로 달려갈 때면 차라리 유니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한다.
“글 쓰는 과정이 꿈이라면 표지는 꿈에서 깨는 것이다.”
이 책은 『축복받은 집』 『저지대』로 널리 알려진 작가 줌파 라히리의 산문집으로 그녀가 옷과 유니폼에 대해 지녀왔던 남다른 단상에서 시작해 책과 표지에 관한 이야기로 뻗어 나간다. 영국 런던에서 벵골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토박이로 자랐다. 세계 최고의 다인종 다문화 국가 미국이지만 그녀는 공립학교를 다니며 낯선 이름과 외모 탓에 아이들에게 자주 놀림을 받았다. 그래서 최대한 남들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랐던 그녀는 자율 복장 대신 학생의 유니폼인 교복을 입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은 그녀가 서른둘 작가로 데뷔하고 책의 옷이라 말할 수 있는 표지를 만나며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 처음 본인의 책을 내며 표지 디자인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된다. 오늘날 책 표지는 독자가 작가의 텍스트를 만나기 위해 만나는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도 표지가 미적인 목적보다는 상업적인 목적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잘못된 표지는 독자에게 손을 건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작가에게도 상처를 입힌다. 어떤 출판사는 그녀의 이름과 사진만 보고 책의 내용과는 큰 상관없이 코끼리나 헤나 문신, 겐지스 강이 그려진 표지를 보내 소통을 위한 책에서 불통의 끝을 보여주기도 한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분노는 그녀가 표지에 대해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쓸 정도로 충분하고도 남지 않을까 싶다. 더군다나 그녀에게 잘못된 표지는 단순히 미적인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좀 더 심각하다. 이방인으로서 ‘강요된 정체성’에 갇혀 자유롭지 못했던 그녀에게 강요된 표지는 ‘나는 누구일까’ ‘난 어떻게 읽혀질까’를 고민하며 불안에 떨었던 지난 과거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독자가 내 책에서 만나는 첫 단어는 내가 쓴 말이길 원한다” 라는 작가의 말은 그녀가 지난 시간 동안 정체성의 혼란으로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케 한다. 동시에 ‘책에도 유니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작가의 엉뚱한 생각에도 선뜻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신체를 가리고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옷은 오늘날 정체성의 표현 수단으로 격상했다. 하지만 결국 옷은 어디까지나 신체에 걸치는 소품으로 한 사람의 단면을 비출 뿐이지 사람의 본질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책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본질은 변치 않는 오리지널 텍스트이니, 화려한 일러스트와 그럴싸한 문구가 써진 표지만 살피지 말고 우선 책을 펼쳐 보는 게 어떨까. 그 속에 진짜 찾던 알맹이가 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