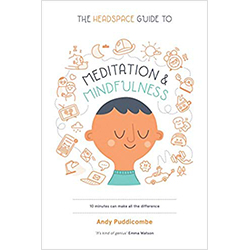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July, 2019
속도
Editor. 박중현
사적으로 고른 책에서 하나의 키워드로 불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당분간 한국문학을 더듬습니다.

김초엽 지음
허블
우리의 일상은 대개 일정한 속도로 이루어져 있다. 일정한 궤도 안에서 일정한 보폭으로 일정한 것에 주목하며 움직이고, 대개 나아간다. 그러다 몸에 익으면 속력이 붙고, 굳으면 관성이 붙는다. 그리고 그것만을 열심히 반복하기도 한다. 끊임없이 진자운동하는 추처럼 탄력받은 속력으로 같은 곳을 맴돈다.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던 시선은 어느새 같은 곳의 높낮이만 확인하게 된다. 좋은 문학은, 간혹 그 우직하고 사람 좋은(?) 녀석에게 ‘따악’ 하고 딱밤을 한 대 먹여 멈추거나 이탈하게 한다. 세상 다 살아 득도한 노인의 일갈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세상 물정 모르는 듯 천진한 소녀의 잡아끎 같이 다가올 때도 있다. 어찌 됐든 중요한 건 뭔가 끼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세상은 그뿐만이 아니라고. 나는 대개 그러한 것이나 녀석들이 고맙거나 사랑스럽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시초지’로 가고 있어. 맞아. 우리가 순례를 다녀오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거야. 신랄한 말투로 나를 타박할 네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네. “어차피 곧 갈 곳을 왜 사고까지 쳐가면서 먼저 떠나는 거야?” 방금 진짜 똑같은 말투로 따라 했는데, 네가 이걸 듣지 못한 게 아쉬워.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고백건대 김초엽 작가의 첫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계획에 없던 책이다. 말하자면 관성으로 고른 책이 아니라 딱밤처럼 날아든 책이다. 날아든 것은 출판사 편집자분의 ‘열일’에서 시작됐지만, ‘따악’ 하고 와닿은 것은 위 발문 중 하나의 문장을 읽은 순간이었다. “방금 진짜 똑같은 말투로 따라 했는데, 네가 이걸 듣지 못한 게 아쉬워.” 마음속에서 열심히 진자운동하던 추가 또르르 떨어져 굴렀다. 사실 막 위대한 문장은 아니다. 문득 쑥 다가온 낙차가 뭉클했다. 이를테면 잊고 있던 감성, 공기, 온도, 속도. 바삐 지내다 문득 올려다본 하늘이 유난히 파랗거나 빨갈 때의 기분. 그 순간 책의 제목이 눈에 밟혔다. 다시 보고, 제멋대로 뭔가 납득했다. 평소 잘 보지 못하던 밤하늘의 별자리 하나를 또렷이 그린 기분. 이런 게 있었지, 참.
지민과 엄마는 작은 서재에 있었다.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가상의 공간이다. 책과 노트, 벽을 채운 그림들, 은하가 지민의 엄마이기 전에 사랑했던 것들, 자신의 삶을 구성했던 것들로 채워진 공간. (…)공간 속에서 은하는 어느 때보다도 선명해 보였다. —「관내분실」
인용한 부분만으로도 따뜻함이 물씬 느껴지지만, 이 책은 감정을 물건으로 만들어내거나 항성 이동이 보편화되거나 새로운 인류의 행성이 존재하거나 외계 생명체와 신체적·정신적으로 접촉하거나 죽은 인간의 마음을 데이터로 저장해 도서관에 보관하는 등 각양각색의, 그러나 어느 먼 미래임에 분명한 이야기를 그리는 SF 소설집이다. 물론 SF라고 해서 꼭 기술적 면모에만 집중하거나 서늘한 디스토피아만 예언하라는 법은 없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SF에 일종의 ‘핍진성’을 부여하는 것은 분명하다. 구현되진 않았어도 실현될 것 같다는 것이 판타지와 구분되는 몰입감이고, 그런 경우 대개 어느 디스토피아가 그려지는 것은 어쩌면 현실적이다. 그러나 사실 SF, 그리고 문학이 지니는 분명한 강점 중 하나는 현실에 대해 ‘유예’를 띤다는 것이다. 어떤 세상을 만들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반응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냐. 흥미로워해야 하는 것은 비단 새로운 상상력만이 아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은 비단 기술만이 아니다. 이념과 주의에 따른 대립, 약자나 타자에 대한 혐오와 배척, 영영 주목받지 못하거나 누구에게도 관심 끌지 못하는 감정들. 2200년이 된다 한들 내게 시간여행보다 더 실현되지 못할 것 같은 ‘SF적’ 존재들이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미래’를 그린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서 진짜 유토피아는 어느 한쪽이 소거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둥켜 고민하는 세상이며, 그게 아니면 (어쩌면) 낭만도 사랑도 성애도 없을 거라는 ‘상상력’ 은 근래 들어 가장 시원스레 동의할 만한 것이었다. 「관내분실」에서 죽은 엄마의 ‘관내분실(도서관 안에서 자료가 분실된 경우를 가리킴)’된 마음 데이터를 찾다가 엄마의 생전 삶 역시 ‘분실’ 상태였음을 깨닫고 가상 공간에서야 진짜 당신과 조우하는 장면은 근래 접한 이미지 중 가장 빠르고도 느린 장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