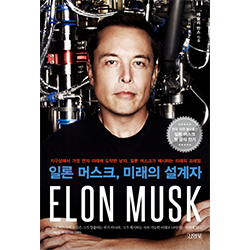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July·August, 2016
섬세한 문체가 전해주는 인간 내면의 감정들
Editor. 지은경
농사에 관한 작은 잡지를 만들며 만났던 농부들을 보며 자신이 놓치고 있는 본질이 무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의 것을 내려놓을 마음도 없는, 즉 이도 저도 아닌 경계선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서 있는 것 같아 심장이 자주 벌렁거린다.

본북스
영화 <경멸>을 본 건 1995년, 즉 대학교 2학년 때였다. <경멸>은 누벨바그 영화의 대표주자인 장 뤽 고다르가 1963년에 만든 영화다. 미술학도였던 나는 “적어도 예술가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지극히 표면적이고도 얄팍한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예술가라면 꼭 해야 할 일 중에는 예술영화를 쉴 새 없이(의무감에 사로잡혀) 보는 일이 있었다. 유럽, 미국, 일본 그리고 제3세계에서 제작된 예술영화, 즉 흥행보다는 작품성과 사고에 중점을 둔 영화들을 비디오테이프에 불법으로 녹화해 대여해주는 가게가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프랑소와 트리포, 장 뤽 고다르, 구로자와 아키라, 데이비드 린치, 미야자키 하야오를 알게 되었다. 지금처럼 수많은 정보가 널리 퍼지는 시대에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작품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그리 큰일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무언가 작은 하나를 알기 위해 들이는 노력과 수고는 매우 크나큰 것이었다.
알베르토 모라비아의 『경멸』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데 책도 아닌 영화와 내 20대 초반 과거의 이야기로 서론이 지나치게 길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술영화 비디오 가게에서 고다르의 <경멸>을 대여해본 후 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경멸>은 영화의 내용상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인 세세한 감정들을 너무도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묘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 그저 멋져 보이기만 한 것들을 가지고 무언가 그럴싸한 것들을 만들어보려고 한 내 생각이 얼마나 큰 오만이며 착각이었는지를 느끼게 되었다. 그랬다.
무엇이든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간단해지고 또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다는 진리를, 그때 어렴풋하게나마 깨달은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영화 이후 진심과 본질에 충실하며 잘 살아왔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그렇지 않다. 새롭게 마음을 먹었던 많은 일이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허물어지는 것들을 자주 목격하곤 한다. 그래서 우리에겐 여러 작가의 책이나 영화, 음악을 곁에 두고 늘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제야 알베르토 모라비아의 책, 『경멸』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최근 예전에 보았던 영화를, 그 원작이었던 소설로 다시 읽게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 『경멸』 역시 그중 하나였다. 모라비아의 많은 소설이 영화화되었는데, 내 생각에 그 이유는 인간의 여러 감정,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사건과 생각이 절대 특별하지 않은 일상에서 자주 묘사되곤 하기 때문인 것 같다. 즉 작가의 실존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 내면을 묘사한 문장들은 영화 속 이미지로 그려지기에도 어색함이 없는 것이었다. 『경멸』은 리카르도와 에밀리아라는 뜨겁게 사랑했던, 그러나 점차 사랑을 잃어 경멸의 감정을 쌓아가는 부부의 이야기다. 하지만 이 책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보다는 인간의 본성, 그 심약함 속에서 피어나는 사악함, 그리고 상대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기에 느끼는 짙은 경멸감을 서술하며 인간관계의 회복, 혹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한 소설이다. 리카르도는 순전히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무리해 집을 샀고,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느낀다. 그러나 극작가로의 야망을 품었던 그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이었으며 결국은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인지해야만 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벌어먹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많은 것을 놓지 말았어야 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충분한 대화 없이 자기 자신과 혹은 타인과 많은 것을 계획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많은 것이 생각했던 바와는 매우 다르게 바뀌어간다는 것을 뒤늦게야 인지하곤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친구나 이웃, 가족들 사이에서 혹은 일에서, 우리가 충분한 대화와 협조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상대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나를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는 아량은 결코 말처럼 쉽게 얻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진심보다는 오해에서 생겨나니 애초에 예상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기록으로 남기거나 혹은 스스로 다짐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조금 덜 괴로울 수 있을까? 20대의 내가 영화를 보며 진심의 중요성을 깨우치며 본질을 보고자 노력했던 것처럼 사실 세상이라는 것이 지극히 미세한 것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극히 단순한 순리로 움직인다는 것을 늘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