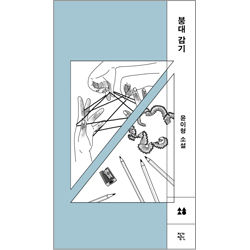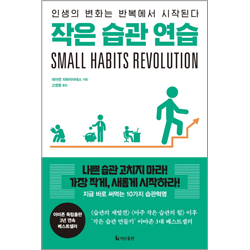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March, 2020
사물의 자서전
Editor. 김선주
읽고 싶은 책은 날로 늘어가는데 읽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느린 독자. 작은 책방에서 발견한 보물 같은 책들을 수집 중.

김영글 지음
돛과닻
어느 순간부터 아날로그, 레트로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눈에 띄게 늘더니 이를 다루는 책도 점점 많아졌다. 특히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문구 열풍이다. 기록하는 도구로서 문구의 매력을 고백하는 책, 문구의 과학이나 역사를 소개하는 책, 문구 여행기까지. 필기를 할 일이 줄어드는 시대에 문구의 약진이라니 의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당연한 존재였던 문구가 이제는 굳이 찾아 소비해야 하는 특별한 취향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듯하다. 실은 이런 흐름을 타고 관련 책들을 찾아보며 남몰래 문구 사랑을 키워오던 참이었는데, 크기도 제각각인 각양각색 독립출판물의 군집 속에서 하얀 표지에 달랑 제목과 이름만 적힌 이 단순한 책이 유독 눈에 띈 것도 그런 관심 덕분이었으리라. 심지어 모나미 볼펜 모양으로 디자인한 책등과 옛날 타자기 느낌이 물씬 나는 독립 활자 디자이너의 본문 서체까지, 이 정도 감각의 책이라면 그 내용이 뭐든 간에 일단 호기심을 달래고 볼 일이다.
『모나미 153 연대기』는 2010년 발행했다가 품절되어서 볼 수 없었던 것을 무려 9년 만에 개정하여 다시 선보인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볼펜인 ‘모나미 153 볼펜’이 실제 한국 근현대 사건과 맞물려온 연대기를 소설의 형식을 빌려 풀어낸다. 사실 이것을 소설이라 해도 될지 모르겠다. 저자 본인이 “이 이야기는 사실에 기반한 허구이기도 하고 허구가 불러낸 사실이기도 한 것”이라 말하듯, 책은 모나미의 탄생부터 단종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실제와 상상을 교묘하게 넘나들며 독자를 경계 어딘가에 데려다 놓는다. 이야기는 왕자화학공업사가 문을 닫고 광신화학공업사에서 모나미 볼펜을 출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잉크병을 들고 다녀야 하는 펜촉이나 만년필도 아니고, 계속 깎아줘야 하는 연필도 아닌, 똑딱 눌러 쓱 긋기만 하면 내장된 잉크가 적절히 묻어나오는 필기구의 탄생은 그야말로 혁신이었다. 끊기지 않고 쓸 수 있는 데다 어디 굴려 먹다가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가격도 저렴하니 이제 모나미 볼펜은 사람들의 가방과 수첩, 주머니, 심지어 버스 운전사들의 조작 레버와 몽당연필의 뒤꽁무니까지 우리생활 곳곳에 자리하게 된다.
책은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볼펜똥의 비밀을 비롯해 153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수집해 나간다. ‘모나미’라는 이름이 프랑스어 ‘mon(나의)+ami(친구)’의 합성어에서 따왔다는 것에서부터 ‘153’이 당시 모나미의 가격 15원과, 모나미를 제조한 회사에서 세 번째로 출시한 문구라는 의미의 3이 합쳐진 것이라는 설명, 그리고 볼펜의 길이가 153mm라거나, 1+5+3이 아홉 끗이 되어 길함을 상징한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름의 유래를 밝히다 못해 책의 본문까지 153쪽에서 끝맺는 지경에 이르면 허구와 실재를 넘나드는 저자의 설계력에 또 한 번 감탄하게 된다.
모나미 153 볼펜 한 자루에 평균적으로 소모되는 A4 용지는 15.6장이다. 한 자루의 잉크를 다 쓰는 데 드는 시간은 평균 4시간 30분이다. 평소보다 힘을 줘 눌러쓰거나 볼펜똥을 많이 닦아가며 쓰면 볼펜 한 자루를 훨씬 금방 끝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연필은 결코 볼펜의 욕망을 따라잡을 수 없다. 금방 닳는다는 것은 금방 다음것으로 연장된다는 뜻이며, 강력한 유한의 속성은 무한의 속성에도 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작은 볼펜 하나가 한국의 압축성장 역사에 절묘하게 관여해온 사건을 통해 펼쳐놓는 예리한 시선은 이 책이 단순히 감성적인 문구 이야기로 남지 않게 하는 또 하나의 감탄할 만한 지점이다. 수정할 수 없도록 볼펜으로 눌러쓴 김기설의 유서를 공안 당국이 위조라고 판결하면서 “권력이라는 신비의 지우개는 볼펜 아닌 어떤 것으로 쓰여진 단단한 진실도 지울 수 있다는 사실”임을 일깨우고, 이근안의 고문 기구나 비행기 폭파범의 자살 도구로 쓰였던 사건까지 읽어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아는 그 모나미 볼펜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비화들이 가득하다.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는 이 하얀 육각형 몸통의 볼펜에 이런 대서사가 정말 있었느냐 하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책은 답한다. 위의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한들 어쨌든 이것은 반(半) 소설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서문을 빌리자면 “과장과 생략과 인용과 거짓말로 구성된 너스레의 조각들”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153 볼펜이 만약 자서전을 썼다면 이 책이 아니었을까 싶다.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면 그만인 연필과 달리 한번 지나간 자리에 그대로 흔적이 남아 돌이킬 수 없는 삶의 기록. 수많은 작가들의 원고를 써냄으로써 상까지 받았던 영광의 순간부터 끈적한 잉크로 얼룩진 고통의 순간 등 153이 온몸으로 겪어낸 일대기. 어떤 소설은 현실보다 더 진짜같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 책은 허구와 상상으로 점철되는 소설이라기보다 어떤 사물의 선택적 이야기로 구성된 자서전이라 해도 좋지 않을까. 볼펜 하나로 모든 역사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볼펜의 속성과 삶을 통해 우리들의 이야기를 비춰볼 수는 있을 것이다. 대단한 사건은 아니더라도 저마다 모나미 153 볼펜에 얽힌 추억 하나쯤은 있을 테니.
나는 사물에 대해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긴 수다가 끝나고 나면 그것이 전혀 사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사물은 결코 사물로서 온전히 머무르는 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