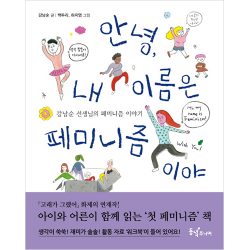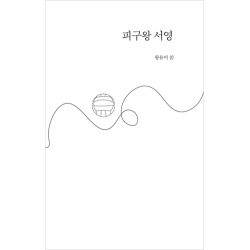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December, 2018
보다
Editor. 박중현
사적으로 고른 책에서 하나의 키워드로 불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당분간 한국문학을 더듬습니다.

문학동네
과거 김애란의 『바깥은 여름』을 이야기하며 취향을 밝힌 적 있다. 문학 중에서 한국문학을 좀 더 애정한다고. 떠올리고 보니 남사스럽고 왜 그랬지 싶지만 절절하게 이유까지 덧붙였다. ‘우리’에게서 태어난 좀 더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사실 거리감이 가치나 우월성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가깝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의 권위이자 감성적 권력에 가깝기에. 내게 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다. 내게 네 얘기가 와 닿는 것은 네가 완벽해서가 아니다. 가깝기 때문이다. 문학으로 돌아가, 같은 이유로 특정 대상에 ‘가까운’ 이야기는 소위 고전이나 명저가 되기 어렵다. 깊이나 범용성 면에서 그렇다. 끽해야 한국 사회 혹은 한국 정서, 그것도 특정 시기 특정 군에만 현실 소구력을 띠는 작품이 ‘훌륭한 문학’이라는 타이틀에 너른 동의를 얻긴 힘들 테니까. 하지만 개인적으론 공감되고 정이 갈 뿐이다. 그런 이야기가 태어나야 했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름 모를 여러 아무개의 사정까지 포함해서.
아무도 아닌, 을 사람들은 자꾸 아무것도 아닌, 으로 읽는다. —5쪽
우리는 대부분 그런 아무개다. 아무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다. 유명인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뉴스도 아니다. 그렇다면 마냥 행복하면 좋으련만, 만사 시원하게 설명되면 좋으련만, 그럼에도 현실에는 설명되지 않고 수면으로 오르지 못하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가득하고 답이 없어(보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 그런 걸로 친다. 그 얘기는 그럼 누가 해주나. 채널로서 소설의 효용이다. 어떻게 알게 하는가. 작가의 존재의의다. 잊지 않아야지, 나는 그런 걸로 안 쳐야지. 한국소설에 ‘정’을 두는 이유 일부다.
그는 그냥 하던 대로 했겠지. 말하자면 패턴 같은 것이겠지. (…)늘 하던 가락대로 땋는 것. 누구에게나 자기 몫의 피륙이 있고 그것의 무늬는 대개 이런 꼴로 짜이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직조해내는 패턴의 연속, 연속, 연속. —「웃는 남자」
조명 자체로도 의미 있다. 하지만 황정은과 『아무도 아닌』은 단순한 시선에 그치지 않는다. 집요히 뚫어져라 본다. 그의 소설이 그려내는 무대와 언어는 독자를 ‘어쩜, 딱 내 얘기야!’ 하고 감성적으로 자지러지게 하는 데 큰 관심이 없다. “매일 저녁 문학의 쓸모를 생각한다”는 그답게 진짜 뚫는 데 관심 있다. 실제로 『아무도 아닌』은 처연하길 거절한다. 오히려 유의미한 균열투성이다. 「웃는 남자」에서 부지런히 일하던 혜지 아저씨가 어린 딸과 눈이 노란 부인을 두고 죽어가는 와중에 저질러진 ‘비극’에 대해 ‘말하자면 패턴’으로 환원되는 표현은 얼마나 서늘하고 날카로운가. 읽는 이의 행동을 촉구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뒤통수를 후려맞은 듯한 균열이다. 또, 소설의 98%를 할애해 언뜻 한 현대인의 비극의 전형을 핍진하게 그리는가 싶더니 그런 주인공도 누군가에게는 ‘씨발 년’이라는 결말(「누가」)에 고려된 시선은 얼마나 다층적인가.
물론 『아무도 아닌』이 전부 이토록 직접적 충격을 시도하는 건 아니다. 현대인, 그리고 다양한 계급과 타자가 겪는 불합리와 일상에 대해 여느 작가처럼 감각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오히려 천천히 더 힘주어서 밀고 나가는 건 그 핍진한 불합리와 일상 속에서도 알지 못하며 알 가능성을 띠지 못하는 ‘나’들이다. 비로소 ‘피륙’을 걷어내고 본질을 마주하더라도 황망한 것은 이 때문이다. 소설 속 주체이자 타자들은 다만 “피곤한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아 눈을 부릅뜨”고(「上行」), “나는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서고 해본적이 없”으며(「양의 미래」),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므로 내 발로 걸어나가야 할 것을 생각해왔”지만 의지는 드러내지 못한다. 아니면 ‘미쳐’버린다(「복경」). 그럼에도 사람들은 “헐떡이는” 그들을 “무심한 얼굴로 바라볼” 뿐이다(「누구도 가본 적 없는」).
그렇게 황정은의 『아무도 아닌』은 일단 세 가지를 본다. 아무의 이야기가 무엇보다 충격적임을, 아무도 가능하지 않음을, 아무도 관심 없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