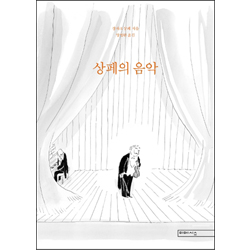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November, 2020
배음(背音)으로
글. 김복희
시인. 밤 사이 새로 심긴 길가의 꽃들이 너무 신기하다. 언젠가 꼭 조경하는 걸 몰래 구경하고 싶다. 시집 『내가 사랑하는 나의 새 인간』 『희망은 사랑을 한다』가 있다.

에드워드 사이드 지음
이석호 옮김
봄날의책
클래식을 즐겨 듣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그렇다, 하고 답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클래식을 잘 모른다. 그쪽 장르에 대해선 누가 뭘 물어봐도 다 모른다고 대답할 자신이 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 클래식이라고 통칭하긴 하지만, 콘체르토가, 심포니가 있고, 퀸뎃(5중주)이 있는가 하면 콰르뎃(4중주)이 있고 또… 클래식 용어 사전을 펼쳐 읽고 나서도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린다. 음악가들이나 성부의 전개 방식 등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알고 들으면 훨씬 잘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잘 못 들어도(이상하게 듣고 있나 싶을 때가 많은데) 어쩌겠어 하는 심정으로 나는 클래식 음악을 적당히 찾아 듣는다. 그러다 보면 이해하려고 한 적 없는데 어렴풋이 이해가 되는 것 같은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차이콥스키의 ‘Swan lake(백조의 호수)’를 가끔 통으로 듣는 경우, 서사와 함께 들은 기억이 있어 그런지 가사가 없는데도 외워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떤 장면에서 그래 이건 이런 뜻의 음악인 거야! 라고 혼자 흥분하고는 한다.(그 장면이 매번 바뀐다는 게 약간 설명하기 민망한 부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모른 채로 듣고 또 듣다가 매번 새로워 하고 놀라워하다가, 종국엔 천천히 알게 되고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도 꽤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최소한 이십여 년 전의 나보다는 클래식을 알게 되었고(세상에 내가 푸가를, 굴드를 알고 있다니. ‘비탄의 성모’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가끔 듣다니. 심지어 취향이라는 것도 생겨서 슈베르트를 연주한 신보가 있으면 모르는 사람의 앨범이라도 일단 들어보게 되다니. 쓰면서 지금 스스로에게 감탄했다), 이제는 음악을 틀어놓고 분명 다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음악 자체에 열중하게 될 때가 더 많아졌다.
서론이 길었다. 그래서 이 책 『경계의 음악』을 만났을 때 기분이 상당히 묘했다. 『오리엔탈리즘』으로 유명한 그 에드워드 사이드 Edward Said가 잡지 『더 네이션(The Nation)』에 기고한 음악 평론과 그 밖에도 다양한 매체에 기고했던 음악 관련 글들을 모아서 읽을 수 있다니. 존경하는 선생님의 일기를 엿보는 기분이었다. 양이 꽤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읽지 못하고 천천히 나눠 읽었다. 학인으로서 뛰어난 그의 업적에도 존경의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그와 별개로 그가 백혈병으로 죽기 2주 전에 쓴 글 「때 이른 사색」도 실려 있다는 것 때문에 더욱 경외심을 갖고 찾아 읽었다. 그 글에서 사이드는“모든 예술작품은 저마다 간단히 축약할 수 없는 독자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산된 시대의 일부라는 운명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후기 베토벤의 독창성에 대해 평하며, 그것을 원숙함이 아니라 폭력성과 실험적 에너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아도르노의 말을 빌려 강조한다. 나는 이 부분 외에도 인용하고 싶은 여러 부분들에 밑줄을 그으며 앞으로 나는 클래식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내 플레이리스트를 어떻게 재정비하고 사랑할 것인가, 내가 왜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것일까, 다시 짚어보게 되었다.
사이드는 1935년 예루살렘의 부유한 사업가 가정에서 태어났다. 1948년 그의 고향이었던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고, 그와 그의 가족은 난민이 되어 모두 이집트 카이로로 떠났다. 그곳에서 사이드는 영국 정부가 세운 공립학교 빅토리아 칼리지를 다니게 된다. 그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학당한 후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엄격한 청교도 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니까 그는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난데없이 이집트에 있는 영국식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영어식 이름을 쓰고 미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사이드가 쓴 책을 소개하기 위한 대부분의 리뷰가 이런 식으로 첫머리에 그의 출신지라든지 그의 이력을 간단하게나마 서술한다. 아마도 그가 품고 있던 고민과 그가 평생 일구어낸 지적 자산이 그의 내력과 아주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민족이나 공동체가 신성불가침의 법칙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야말로 난데없이 마주하는 생의 조건 속에서 경계인으로 끝없이 살아가야만 했던 그에게 감성의 영역으로 치부되기 쉬웠던 음악을 이성의 영역인 언어로 읽어내고 정제하여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일이었을까. 또한 어디서건 동일하게 통용되는 악보는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에 대해 질문하면서 내가 클래식을 듣는 이유에 대해서도 왠지 답을 내리고 싶어졌다. 나는 앞으로도 클래식을 좋아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좋아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세계를 이해하고 싶어서, 라고 이유를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을 예정이다. 누군가의 내면이 복잡하다면 그 복잡함만큼이나 그 사람의 내면을 만들어내는데 온 힘을 쏟아붓는 세계의 거대한 기세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싶어서, 라는 말을 배음(背音)으로 남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