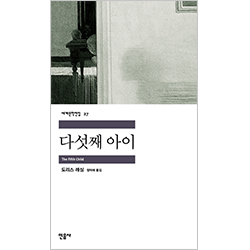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June, 2018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듣도 보도 못했단 말예요!
Editor. 박중현
『여행하는 채소 가게』에 대한 불친절하고 사적인 한 마디 “정신이 여행합니다.”

스즈키 뎃페이, 야마시로 도오루 지음
haru 출판사
농사 얘기가 나오면 현대인은 으레 회상(?)에 잠긴다. 어릴 적 할머니 할아버지 댁 내려가서 봤던 푸르른 논밭을 생각한다거나 그때 맛봤던 옥수수며 과일, 곡식, 달걀 맛 등을 떠올리며 ‘아 참 맛있었지’라거나 ‘그 맛을 잊을 수 없단 말이야’ 하고 급작스레 우수에 젖는다. 혹은 나랑은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저기 어디 먼, 눈빛만 보면 미국이나 일본보다 먼 원더랜드를 떠올린 모양새가 된다. 아니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어우 난 못해’ 가볍게 질색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식탁엔 매번 갖가지 농산물이 오른다. 때론 흰 쌀밥에 배추김치며 나물을 척척 올려 입으로 가져가 꼭꼭 씹으며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 물론 그래온 1인이다.
우수에 젖어가며 회상할 필요 없이 그 맛있는 (아마도) 유기농 농산물은 지금도 먹을 수 있다. 어디 멸종된 것도 아니고 기술 전수자(?)의 맥이 끊겨 더는 재배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추억 한소끔이 보정한 맛은 어떤 조미료로도 채우기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지금도 사다 먹을 수 있다. 안 샀을 뿐이다. 또한 매끼 수저에 안착해 입안으로 줄기차게 드나드는 식재료가 생산된 환경에 대해 갖고 있는 거리감이 웬만한 외국보다 멀고 아예 관심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니. 식사 때마다 농부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고 이 식재료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어떤 산과 물을 넘었는지 일일이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매일같이 입으로 들어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존재들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확실히 뭔가 ‘배제되었다’라고 느껴질 만치 어색한 측면이 있다. 현대인에게 밥보다 친숙한 스마트폰도 좋아보이면 ‘와 씨 어디 꺼야?’ 묻는데, 밥을 맛있게 한술 뜬다고 해서 ‘와 씨 어디 꺼야?’ 묻진 않으니 말이다.
두 가지 방향에서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우리 피부에 와닿도록 좀 더 중요한 것은 이 식재료가 어떤 과정으로 자랐는지보다 여전히 값이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거나 재배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보다 ‘먹느냐’가 아직은 좀 더 중요하다. 이러한 소비적 동의는 당연히 유통과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중요히 여겨지는 건 ‘돈’이다 보니 지갑이 열릴 만한 가격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고, 시장 공급상 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거대 단위로 묶을 수 있는 규격화가 불가피하다. 기준 역시, 즉각적으로 확인 가능하며 객관적이어야 하니 눈에 드러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크기가 크고 양이 많은지, 상처 있거나 빛이 바래지 않았는지 따위가 그렇다. 정확한 맛은 대금을 치르기 전엔 알 수 없으므로 ‘기준’에서 자리를 꿰차기 힘들다. 그러므로 맛있어도 기준에 미달해 버려지는 농산물이 많다. 하물며 ‘제값’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가늠조차 힘들다. 이렇다 보니 수익 채산성과 기준을 모두 만족하려면 현실적으로 대부분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우리가 흔히 구입해 식탁에 올리는 대부분 농산물이 탄생하고 절찬 판매되는, 그리고 농사에 관해 무관심한 향수에 젖게 된 경위다. 고백건대 내가 무슨 농사 마니아라서 이런 글을 쓴 건 아니다. 『여행하는 채소 가게』를 읽고 든 감상을 적어본 것뿐이다. 혹시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라는 초조함(?)이 마구 샘솟고 있다면, 이제 이 책을 쓴 두 청년 사장의 ‘여행’에 함께할 준비로 완벽하다.
—“보통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오늘 먹은 쌀과 채소는 어떻게 자랐을까?”
—슈퍼마켓에 진열된 채소와 과일은 모두 색이나 모양이 훌륭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유통되는 채소에는 엄한 규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규격 외의 채소는 구부러지거나, 상처가 있거나, 색이 옅거나,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유통되지 못합니다. 농가는 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사용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규격에 맞는 채소를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채소 가게가 돼야겠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보기에 나쁘다고 팔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못생긴 채소도 사들이는 채소 가게가 되자.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줄일 수 있는 채소 가게가 되자.